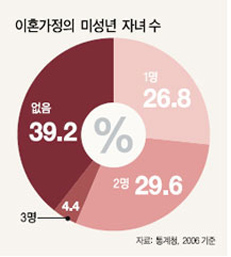
이혼소송에 들어간 부부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울화로 가득 차 있다. 이럴 때 손에 쉽게 잡히는 도구가 자녀다.
별거 중인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간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안 해주면 아이 얼굴 못 볼 줄 알라”고 을러댄다. 유치원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와 지방의 친척집에 맡겨놓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혼자 키우면서 고생 좀 해보라’는 생각으로 집을 나간다.
부-모-자녀의 ‘3각관계’가 뚜렷해지면 치열한 ‘내편 만들기’ 경쟁이 벌어진다. 자신의 폭력이나 불륜으로 배우자가 집을 나갔는 데도, 아이에게 “바람나서 가출했다”고 말한다. 한 남편은 아내 쪽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를 아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엄마가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간다”고 주입하는 것이다.
심지어 ‘정보원’으로 쓰기도 한다.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다. “엄마가 누구를 만나는지 지켜보렴. 난 너만 믿어.” “누가 아빠 만나러 집에 오는지 얘기해줄래?” 자녀에게 직접 진술서를 쓰게 한다. 아이는 반대쪽 부모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된다. 갑자기 양육자가 바뀌기도 한다.
서울가정법원 김요완 조사관은 “자녀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정보제공을 계속 요구하는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써 더 큰 죄책감에 빠진다”고 말한다.
아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엄마를 만나면 매를 맞는다는 등의 ‘가족 규칙’이 공고해진다. 아이는 더욱더 양육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다. 부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다시 자녀 부부의 갈등을 낳는다. 세대를 내려가며 이혼을 대물림하기 쉽다. 가정법원 김영훈 판사는 “조사관의 중요한 역할이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이혼을 마음먹었더라도 제3자인 자녀의 인생까지 불행하게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조사관이 상담을 할 때 꼭 읽어주는 칼릴 지브란의 시 구절이 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는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