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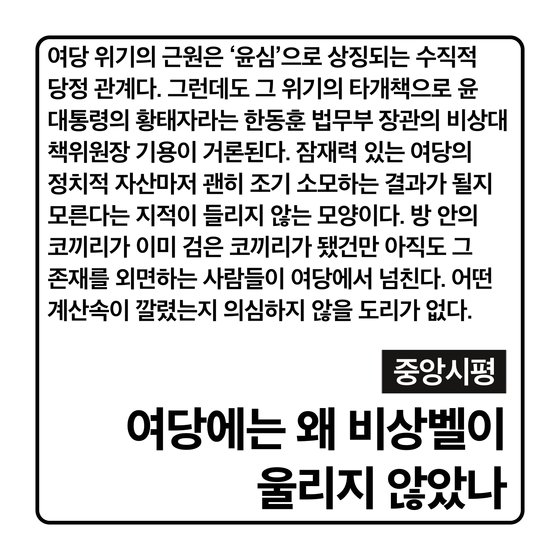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과정에서 당내 초선의원들이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서병수·하태경 등 중진들이 김 전 대표 사퇴를 촉구하자 일부 초선들이 ‘자살특공대’ ‘진짜 X맨’ ‘퇴출 대상’ 같은 표현을 써가며 이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김 대표 전격 사퇴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 전개에 졸지에 길을 잃고 말았다. ‘윤심’이 실렸다는 김 전 대표에게 줄을 서다 시쳇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다.
이런 ‘웃픈’ 해프닝은 우연이 아니다. 여당의 취약한 중도층 기반이 회복 탄력성(resilience)의 약화로 이어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번지수 잘못 짚었던 문제의 초선들은 대개 여권의 양지인 ‘양남’, 즉 영남과 서울 강남 지역구 출신이다. 여당 내 짙은 위기감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서울 강남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구 초선 의원은 단 세 명(최재형, 배준영, 최춘식)이다. 중도층이 판세를 좌우하는 수도권 민심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수정당 내부 정풍운동의 대표적 사례였던 16대 국회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18대 국회 ‘민본 21’의 주도 세력이 거의 다 수도권 지역구 초선이었다는 점과 대비된다.
거듭되는 징조에도 경고등 안 켜져
위기는 어느덧 ‘검은 코끼리’로 변해
당내 둔감과 계산속이 사태를 키워
한동훈 카드가 반전 계기 될 수 있나
위기는 도둑처럼 온다는 말은 둔감하고 게으른 자의 변명이기 쉽다. 대부분의 위기는 숱한 징조와 경고를 앞세운다. 대형 재해가 나기까지는 평균 29번의 ‘소(小) 재해’와 300건의 자잘한 사건들을 앞세운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왜 생겨났겠는가.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는 법이다. 지금 여당의 위기가 있기까지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중도층 기반이 약한 당내에서 경고등은 울리지 않았고, 이는 다시 중도층 이탈이라는 위기를 심화시켰다. 악순환이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며 보수 정당은 중도층 지지 회복에 간신히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흐름은 잠깐이었다. 그 승리가 자신의 매력과 역량 덕분이 아니라 상대의 오만과 독선 때문임을 잊어버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서오남’과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인사, ‘체리 따봉’으로 불거진 당무 개입 논란 등은 사실상 ‘소재해’ 수준이었지만 무시됐다. 대선 전부터 대통령 부인 관련 문제가 떠올랐지만 유야무야됐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거나, 하다못해 제2부속실을 설치해 배우자의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다. 명품백 논란 같은 리스크는 그 둔감의 결과다.
특히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두 달 사이 여권의 모습은 ‘집단 착각’에 빠진 듯한 느낌마저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부산 엑스포 유치로 난국을 타개한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국정 시스템의 허점만 드러내고 말았다. 대통령 뒤에서 떡볶이 접시를 들고 어색한 웃음을 띤 채 도열한 기업 총수들의 사진만 남았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건만 외교 라인과 참모진에 대한 이렇다 할 문책조차 없다. 이들이 도대체 무슨 ‘고생’을 했는지, 마치 보상받겠다는 듯 선거판 양지를 기웃거리고 있다.
‘검은 코끼리’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조어(造語)다. ‘검은 백조’와 ‘방 안의 코끼리’를 합친 말이다. 검은 백조는 가능성은 작지만 터졌다 하면 대재앙이 될 사건을 말한다. 2008년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터진 코로나 팬데믹 등이 그 예다. 방 안의 코끼리는 누구나 뻔히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른 척 덮어 두는 문제를 말한다. 이 둘을 합하면? 내버려두면 대재앙이 될 만한 위험의 존재를 알면서도 짐짓 외면하는 일을 말한다. 나서봤자 좋을 일 없다는 계산속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기후위기에 이 말을 썼지만, 여권 상황에 대입해도 어색하지 않다. 묻고 싶다. 정말 이런 위기의 징후를 읽지 못했나. 위기 신호에도 비상벨이 울리지 않은 것은 둔감함이거나 계산속, 혹은 이 둘 다 때문일 것이다. 여당 초선들의 소극(笑劇)은 어느 쪽일까.
여당 위기의 근원은 ‘윤심’으로 상징되는 수직적 당정 관계다. 그런데도 그 위기의 타개책으로 윤 대통령의 황태자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기용이 거론된다. 논리적으로 맞는 수습책일까. 친윤계에선 “히딩크도 한국 축구를 몰랐지만 4강 신화를 만들지 않았느냐”는 논리를 편다. 글쎄. 히딩크가 ‘한국 축구’는 몰랐겠지만, 축구에는 도사였다.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가 여의도를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은가. 잠재력 있는 여당의 정치적 자산마저 괜히 조기 소모하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방 안의 코끼리가 이미 검은 코끼리가 됐건만 아직도 그 존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여당에서 넘친다. 어떤 계산속이 깔렸는지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글=이현상 논설실장 그림=윤지수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