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혜 글항아리 편집장
윌리엄 트레버나 존 밴빌이 ‘파리 리뷰’와 했던 인터뷰를 보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성과 빛나는 형식이다. 회고록 쓰기의 가이드라인인 베스 케파트의 『진실을 다루기』 역시 경험보다 이야기 구성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당신은 폭력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알코올 의존자였는가. 그런 과거가 친구나 상담사의 귀를 쫑긋 세울 순 있지만 독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잘 짜인 태피스트리가 되기 전까지는.
일반인의 자전적 글쓰기 늘어
경험보다 이야기 구성력 중요
주변 사람 얘기는 동의 얻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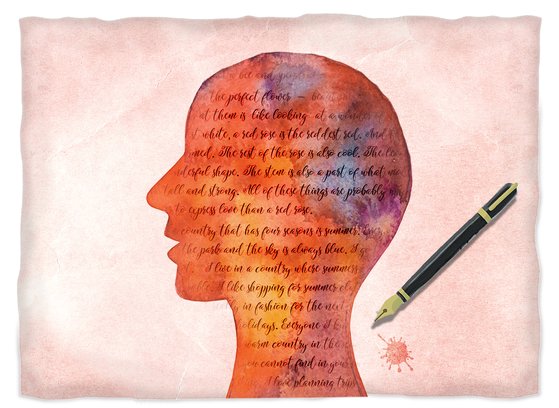
김지윤 기자
왜 많은 사람은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려 할까.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충동이 끓어서겠지만, 더 큰 이유는 앞날을 잘 살려면 과거를 재해석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우리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 자신의 과거와 충돌시킨다. 잘 싸우면 더 나은 미래가 손에 쥐어질 수도 있으므로.
일기, 편지, 회고록 출판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개인사 공개를 격려하는 분위기이며, 글쓰기 워크숍 역시 자신을 글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제이미슨, 유크나비치, 게이가 자기 상처에서 생긴 고름을 잉크 삼아 글을 쓴 좋은 사례다.
문제는 기억과 해석이 개인마다 다르고, 작가의 주변인들은 부지불식간에 자기 정체를 세상에 내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분쟁의 씨앗을 틔우지 않기 위해 쓰는 이는 상대에게 미리 동의를 구한다. 허가받지 못하면 대개 쓸 수 없다. 세부 사항을 바꿔 쓸 수 있겠지만, 각색이 많으면 자전적 회고록은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게다가 사전 동의가 상처를 없애주진 못한다. 책 출간 후 작가의 가족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 훼손된 관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자전적 글쓰기의 업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에세이를 쓸 때 나 역시 몇몇 지인에게 개인사를 들려달라 청했고, 흔쾌히 수락한 이들 중 두 명은 하루 만에 철회 의사를 밝혀왔다. 글의 재료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통제가 불가능한 서사 속에서 무력한 위치에 놓이는 반면, 저자는 권력자의 지위에 선다. 글과 책이 힘을 못 쓰는 시대라지만, 펜은 여전히 무기가 될 수 있다.
편집자로서 개인사를 다룬 원고를 검토할 때 기준이 있다. 첫째, 폭로성인가? 폭로 성격의 글은 저자와 폭로 대상 간의 문제를 독자에게 떠넘기는 인상을 주며, 이는 저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둘째, 상대를 비난하는가? 비난은 언뜻 비판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상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글에 드러나지 않으면 일방적 비난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혹은 글로 쓰기 전 삶에서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려 노력했는가를 독자 중 일부는 눈여겨본다. 즉 우선순위는 글이 아닌 삶이다.
셋째, 글로 표현된 기억이 높은 완성도를 갖추며 예술적인가? 대개의 독자는 저자의 기억이 자신에게 날 것 그대로 던져지길 원치 않으며, 작품으로 감상하길 바란다.
지난 몇 년간 회고록 번역이 활발했다. 위에서 말한 작가 외에도 『안젤라의 재』 『더 글라스 캐슬』 『H마트에서 울다』 『기억의 발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앞의 둘은 미국에서 가족이나 독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다. 가족사가 너무 적나라했거나 혹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 줄리 마이어슨의 『잃어버린 아이』는 저자가 약물 중독자 아들의 동의를 얻어 썼음에도 10대 청소년의 삶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난을 샀고, 소설가 존 치버의 딸 수전의 회고록 역시 아버지의 문학이 갖는 다면성을 고려 못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반면 비비언 고닉의 회고록은 거의 누구도 문제 삼은 바 없다.
최근 내가 편집에 참여한 책 『전쟁 같은 맛』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 책은 사회학자의 시각에서 한국전쟁의 여파를 관통한 어머니의 삶을 일종의 공적 역사로 치환한 것이다. 회고 대상인 어머니가 딸의 저술을 지지했을뿐더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한참 뒤에 출간됐지만 가족 중 일부가 ‘수치심’을 느낀다며 문제 삼았다. 특히 사실관계를 둘러싼 시비는 올바른 증거 자료로 맞서도 격렬한 감정을 쉽게 봉합하지 못한다.
회고록이 새로운 상처를 피해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지만, 모든 이로부터 찬사나 동의를 받긴 힘들 것이다. 글에는 작가 고유의 관점이 녹아 있고, 게다가 회고록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문제 많은 삶에서 그것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기 위함이다. 즉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내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정확히 판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윤리성과 설득력 면에서 준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책이 최근 출간됐다. 바로 고닉의 『상황과 이야기』로, 더 많은 사람이 이를 참조해 개인사를 공공의 역사에 편입하길 바란다. 내가 쓰려는 ‘악마화된’ 인물에게 얼마나,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가라는 핵심 문제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이은혜 글항아리 편집장




![[초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대기업 상무 출신, 전문기술 배우려 또 대학에…"몸 낮추고 몸값 올리는 노력은 계속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ac8138be-929f-4f41-8283-4cdfa711b01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