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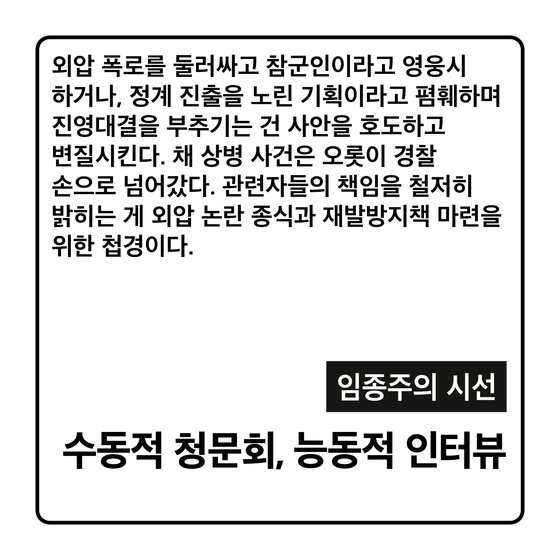
얼마 전 소모임에서 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설’이 꽤 뜨거운 화제에 올랐다. 그도 그럴 만했던 게 '축소 외압'(박정훈 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니 '집단 항명 수괴'(국방부)니 어마무시한 말들이 서로 맞부딪치니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게다.
국방장관 재가를 거쳐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국방부가 추가 법률 검토를 이유로 당일 돌연 회수한 것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장관이 제대로 안 보고 덜컥 사인부터 했다는 건가? 실수가 있었다 해도 “이첩보류 명령이 있었다”(국방부) “없었다”(박 대령)를 놓고 요란한 진실공방이 뒤따를 정도로 지휘 체계가 난맥인가? 죽 늘어선 의문 부호 앞에 바짝 곤두선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의 촉수는 박 대령의 생방송 출연(11일 KBS ‘사사건건’)으로 타깃을 옮겼다. 순간 누군가의 뇌 신경회로에 반짝 불이 켜졌다. “올리버 노스 중령이랑 판박이네!”
1980년대 강력한 반공정책을 펼친 레이건 미국 행정부는 중남미 공산화를 손 놓고 지켜볼 수 없었다. 틈을 엿보다 니카라과 반군단체 콘트라를 은밀히 지원했다. 그 돈은 테러지원국 이란에 몰래 무기를 팔아 마련했다. 반군 지원 금지를 규정한 볼랜드 수정법 위반에, ‘테러국과 흥정은 없다’는 외교 대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미국 최대 정치 스캔들 이란-콘트라 사건, 올리버 노스 중령은 그 입안자이자 실행자였다.
해병 출신으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참모였던 노스 중령은 1987년 7월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갔다. 평소 즐겨 입던 양복 대신 빳빳하게 다린 진녹색 해병대 정복 차림이었다. 선서대에 오른 그의 양쪽 가슴에선 흉장과 휘장이 조명을 받아 빛이 났다. 꼿꼿함을 잃지 않은 노스 중령의 답변에는 거침이 없었다.
리더십 분야 권위자 제프리 페퍼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당시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방영된 청문회에서 노스 중령은 자신이 서류를 파기했고,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며, 니카라과 반군 지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시인했다. 노스의 말과 행동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노스는 사건의 전말을 직접 지휘 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일을 그렇게 만들었다' 같은 말을 자주 사용했다.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인상은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 책임자라는 사실이었다."(『권력의 기술(원제 Power)』)
“법은 어겼지만, 나라를 위해 그랬다”는 노스의 항변은 당시 보수적 분위기의 미국 사회에 제대로 먹혀들었다. 각본 없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노스는 엿새간 계속된 청문회를 거치며 일약 애국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당시 ABC 조사에선 92%가 ‘노스가 방어를 잘했다’고 평가했다. 64%는 노스를 악당이 아닌 스캔들의 피해자라고 여겼다.
그런데 노스 중령의 청문회와 박 대령의 방송 출연은 차원이 다르다. 전자가 피동적·강제적 환경이라면 후자는 능동적·선택적 무대다. 보는 이에 따라 감응에 차이를 주는 지점이다. 혹자에게 두 사람의 면모가 겹쳐 보였다면, 혹자에겐 박 대령이 이미 성명발표와 현장 취재진 문답 등을 통해 입장을 개진한 상황에서 ‘과연 방송 출연까지 필요했을까’하는 궁금증이 남는다. 인터뷰 내용이 기존 주장의 재확인 수준이었고, 그 진실 여부를 떠나 군 내부 규정(악법이라고 하더라도) 위반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방부 또한 득달같이 집단 항명 수괴죄(추후 '항명'으로 변경)부터 들이댄 건 과했다. 논란 와중에 해병대수사단 보고서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사단장·여단장을 빼고, 대대장 2명만 적시해 경찰에 재이첩한 것도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박 대령 생방송 출연’ 엇갈린 반응
영웅 vs 기획폭로 진영 대결 대신
외압·항명 진상 엄정하게 가려야
외압 폭로를 둘러싸고 참군인이라고 영웅시하거나, 정계 진출을 노린 기획이라고 폄훼하며 진영대결을 부추기는 건 사안을 호도하고 변질시킨다. 채 상병 사건은 오롯이 경찰 손으로 넘어갔다.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밝히는 게 외압 논란 종식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첩경이다. 항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공정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어설픈 봉합은 훗날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란-콘트라 사건은 흐지부지 끝을 맺었다. “나는 몰랐다”고 발뺌한 레이건 대통령은 탄핵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노스 중령을 포함해 기소된 실무자들은 얼마 안 가 모두 면책되거나 사면됐다. 국민을 속이고, 법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시대의 스캔들은 그렇게 덮인 채 두고두고 후대에 부담이 됐다. '노스 영웅론'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글=임종주 정치에디터 그림=임근홍 인턴기자




![[초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대기업 상무 출신, 전문기술 배우려 또 대학에…"몸 낮추고 몸값 올리는 노력은 계속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ac8138be-929f-4f41-8283-4cdfa711b01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