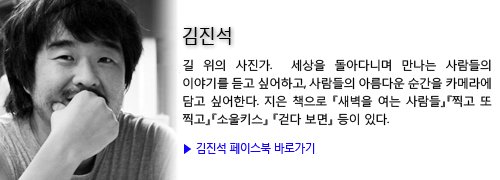여기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걷다 보면』 이라는 책에도 실렸고, 오래전 페이스북에도 올렸던 사진입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독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었나?”
제 사진의 대부분은 길 위에서 찍은 것입니다. 간혹 걷는 게 우선인지, 사진이 우선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도,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사진의 배경은 네팔 쿰부히말라야입니다. EBC(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가는 길입니다. 길의 시작은 루크라(2800m)부터입니다. 2800m라는 높이는 제가 살면서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이였고요. 고산병 증세로 카메라를 질질 끌고 올라갔던 기억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아이를 만난 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걷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놀고 있는 아이를 보았지요. 뒤로는 히말라야의 배경이 보이고, 평화롭게 보이던 오두막 같은 집 앞에서 아이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지금 생각해보면 아이의 눈에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선 근처에 있는 아이 엄마에게 허락을 받고, 아이 앞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아이에게 허락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어서 먼저 이야기 드리자면 '눈빛으로 교환했다'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아이가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쑥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내리고 아이와 한참을 눈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말이 전혀 안 통하기 때문에 눈웃음, 때론 간절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이 아이였을까요. 사실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를 보는 듯했습니다. 쌍꺼풀에, 볼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붉게 물들었고, 낯을 가려 사람을 잘 쳐다보지 못했던 시골의 어린 제 모습을요. 뭐 어릴 적 추억이 그리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이를 통해 그 기억을 꺼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이는 자기 몸보다 조금 큰 옷의 소매를 입에 물고 슬그머니 저를, 아니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손가락은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사진을 연속해서 네 장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을 아이에게 보여주니 자기 모습에 어색해 하며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던 뒷모습이 기억나네요. 엄마에게 사진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메일이나 주소나 받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네팔의 지진 소식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이 아이의 표정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현실은 그저 멀리서 무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은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멈춰져 있던 기억과 추억, 심지어는 그 당시의 감각까지도 살아옵니다. 오늘 아이의 사진에 질문을 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