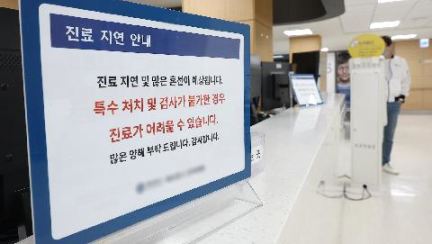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고마워 오바마(Thanks, Obama)’.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유가 든 유리잔에 쿠키를 집어넣으려다 쿠키가 너무 커 들어가지 않자 체념하듯 이 말을 내뱉는다. ‘모든 것이 오바마 탓’이란 뜻의 이 말은 원래 미국인들이 일이 안 풀릴 때마다 걸핏하면 대통령 탓을 하며 내뱉었던 반어적 표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동영상에 출연해 이 말을 직접 써 가며 정치 유머의 진수를 보여 줬다.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 이 장면은 오바마 케어 가입이라는 메시지를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데 무척 효과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 감수하고 나선 이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끊임없이 설득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능력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설득은 주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예로부터 대통령의 수사학(rhetoric)은 학문적 영역으로까지 자리 잡았다. 대통령의 수사학은 단지 언어 표현이나 기법만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수사학적 대통령제(Rhetorical Presidency)’라는 개념으로 발전됐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할 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인인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검증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직은 이러한 레토릭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는 이론이다. 대통령의 말에 담길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설득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어떨까. 취임 이후 그간의 연설문에서 보듯 그의 애국 충정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다. ‘진돗개 정신의 각오로’ ‘불타는 애국심’으로 무장해 ‘쳐부술 원수’이자 ‘암 덩어리’인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고, 개혁 추진에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고 설파한다. 여느 대통령보다 강한 표현이다. 가슴을 쿵쿵 울리는 그 표현만을 놓고 보면 당장이라도 너도나도 개혁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할 듯한 분위기다. 그런데도 왜 70%에 가까운 국민은 그를 지지하지 않는 것일까.
논리학에서 흔히 쓰는 ‘자비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다. 화자가 실수하거나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더라도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최대한 이해하려 애쓴다는 말이다. 친밀한 사적 관계에서야 이런 원칙이 통하지만 정치적 연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적 주장에는 항상 이해당사자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적 수사에는 ‘내 말에 설령 이해가 안 되더라도 대국적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는 식의 어법은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수사는 자비의 원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반론이나 저항이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이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섀뮤얼 커넬 미 UCSD 대 교수가 제시한 ‘going public’개념은 최근 미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설득의 리더십을 설명해 준다. 대통령이 공중 속에서 호소한다는 뜻의 이 개념은 주로 대통령이 지방 공장이나 학교 현장 등을 방문해 해당 지역 청중 앞에서 연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흔히 덕담으로만 그치고 마는 한국 대통령의 현장 방문과는 달리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설 주제와 방문지의 성격을 철저히 연계시킨다. 연설을 통해 실질적인 주제로 발전시키면서 청중, 나아가 국민의 호응을 얻어내는 고도의 정치적 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며칠 있으면 3·1절이다. 지금이야말로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듣고 싶어 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고 위기 극복을 설득하려는 대통령의 진정성도 담겨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설득이라 써 놓고 자기 주장만 읽는 격이어선 안 된다. 감동에 찬 3·1절 기념사를 기대해 본다.
홍병기 정치에디터 klaatu@joongang.co.kr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d6e8bbf8-3a6a-47a3-8d3c-4bfc168b4c42.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