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준
장하준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경제학
이번 정부는 서비스 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몇 달 전 경제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발전이 우리 경제의 명운과 관련되어 있다”고까지 했고, 지난 1년간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촉진 대책의 많은 수가, 의료나 관광 등 서비스업 규제 완화책들이다.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들이 산업정책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해가 되는 일이다. 국제적 기준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 업종들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의료·소프트웨어 등 우수 인력이 많은 업종들을 수출산업으로 키우면 경제에 득이 된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발전시키면 좋다고 하는 것과, 서비스 산업 발전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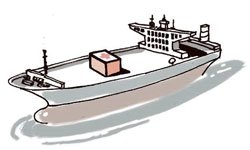
서비스 중심의 경제전략에 깔려 있는 이론은 탈산업화경제론이다.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제조업 제품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서비스업이 경제의 중심이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30년간 모든 선진국에서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었다.
그러나 탈산업화가 제조업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제조업 생산량의 절대적 감소가 아니라 제조업 제품의 상대적 가격 하락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 제품의 상대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제조업의 생산성이 서비스업 생산성보다 더 빨리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조업 제품의 상대적 가격 하락을 고려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지난 20~30년 동안 미국·스위스·스웨덴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났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다고 하는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미국·영국 등은 종업원 1인당 판매액수 기준으로, 소매업 생산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는 많은 부분이 서비스의 질을 낮추어 이루어진 것이다. 종업원의 수를 줄여 점포에서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20~30분씩 기다리게 한다. 교외에 대형 마트를 열어서 판매 단가를 낮추지만, 고객은 장시간 운전해야 갈 수 있고, 가서는 턱없이 큰 매장을 힘들게 걸어다녀야 하니, ‘소매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제품의 질이 떨어진 것이다. 소매업 생산성을 올린다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따라 해야 할까?
이에 더해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특성상 국제교역이 힘들고, 따라서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제수지 문제가 생기기 쉽다. 서비스 수출이 엄청 발달했다는 미국의 경우도, 서비스 부문의 무역수지 흑자는 GDP 대비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제조업을 비롯한 상품 분야에서 올리는 GDP 4%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기에는 어림도 없다. 후진국 중에 서비스업 수출로 성공했다는 인도의 경우도, 서비스 부문 흑자는 GDP 대비 1%인데 상품 부문 적자는 5%다.
규모의 문제도 있다. 의료산업이 가장 좋은 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의료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우려고 한다.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명으로 OECD에서 꼴찌에서 3등(OECD 평균은 1000명당 3.2명) 하는 나라에서 과연 의료를 수출산업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세계 어디에도 의료 수출로 큰돈을 버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료 수출로 번 국제수지 흑자가 GDP 대비 우리나라의 4배에 달했지만, 2011년 GDP의 0.012%에 불과했다(우리나라는 2011~2012년 평균 GDP의 0.003%).
상대적 규모로 세계 최대의 의료수출국인 체코가 벌어들인 의료 부문 국제수지 흑자는 우리나라의 45배였지만, 역시 GDP 대비 0.136%에 불과했다(2011년).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거두는 무역흑자가 GDP 대비 1.1%, 자동차 분야의 무역흑자가 GDP 대비 4.1%임에 비추어 볼 때(2011~2012년 평균), 우리나라가 의료 수출을 45배 늘려 비율적으로 체코만큼 흑자를 거둔다고 해도, GDP 대비 무역흑자의 규모가 반도체 부문의 8분의 1, 자동차 부문의 3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다.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수출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서비스 산업 발전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정부가 헛된 곳에 정책 추진력을 낭비하고 우리 경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 같아 큰 걱정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경제학



![[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