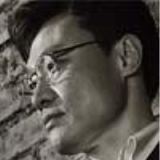이규연
이규연논설위원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소치 겨울올림픽에서 메달순위 1~4위를 오르내리는 빙상 강국이다. 이것 말고도 두 나라의 공통점은 여럿 있다. 1인당 GDP 수준이 높으면서 행복지수 역시 세계 10위 안에 든다. 북해발(發) ‘자원 로또’를 맞은 것까지 같다. 네덜란드는 1950년대 말 무진장한 천연가스를 발견했다. 노르웨이 역시 북해에서 석유 대박을 맞았다. 다만 무수한 공통점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는 사뭇 달랐다.
“우린 네덜란드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14년 전인 2000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만난 현지 상공인이 들려준 얘기다. 천연가스를 팔자 엄청난 달러가 네덜란드로 굴러들어왔다. 임금·물가가 치솟았다. 가만히 있어도 되다 보니 대부분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갔다. 재정흑자를 사회보장 확대에 투입하면서 근로의욕도 줄어들었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한때 극심한 경제위기와 복지병을 겪게 됐다. 당시 그 상공인은 다소 어두운 오슬로의 밤거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산유국임에도 네온사인을 자제하고 기름값을 비싸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해 힘을 비축 중이지요.”
노르웨이는 1990년 국영석유기금법을 만들었다. 석유 로또로 생긴 돈을 최대한 쌓아놓았다. 30~50년 뒤 미래세대에게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해 주려는 배려였다. 의회 승인이 없으면 기금을 쓰지 못하게 했다. 연구개발·교육에 과감히 투자했다. 당시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중진국 수준이었다. 그 후 꾸준하게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어섰다. 석유기금은 당시 100조원대에서 지난해 800조원대로 늘었다. ‘후손의 몫을 훔치지 않는 나라’의 전범이 된 것이다.
두 나라의 ‘비슷한 상황, 다른 선택’이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뭘까.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틀을 벗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려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과 장년·노년층 사이에 갈등이 커진다. “네가 좋아진 만큼 내가 나빠진다”는 제로섬 식 논리가 지배한다. 최근 가동에 들어간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세대의 이해관계가 터져 나온다. 젊은 세대 차별론과 노년세대 배려론이 맞붙는다. 대개 복지 논의를 정치권에 맡겨 놓으면 지금 세대의 권익만 보장하려 한다. 표를 주는 세력을 대변하는 대의(代議)민주주의의 함정에 빠진다. 이럴 때 미래세대는 유용한 사다리가 될 수 있다.
미래세대를 이렇게 정의해 보자. 우리의 결정에 가까운 훗날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지금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세대,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와 조만간 태어날 후손들이다. 젊은 층이든, 노년층이든 현 세대이기는 매한가지다. 그들은 정치의 장에서 저마다의 권익을 주장한다. 그들과 달리 미래세대에는 발언창구나 입이 없다. 묘하게도 사회보장·고용·환경·연구개발의 구조를 만들 때 침묵을 무시하고 주장만 좇다 보면 늪에 빠지기 십상이다. 반면 젊은 층과 노년층이 아닌,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한 자원배분을 추구하며 뚜벅뚜벅 걷다 보면 역설적으로 현 세대에게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찾아올 수 있다.
서점가에는 세대전쟁·세대갈등 제목을 단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선진국의 문턱을 넘으려면 불가피하게 겪게 될 통증일지 모른다. 신·구 간의 대결전선에 미래세대가 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정자이자 탈출 도구가 된다. 당장 올해 안에 연금·일자리·임금구조의 새 판을 짜야 한다. 논의의 중심에 미래세대를 두고 관련 제도·법·기구를 만들어 보자.
최근 노르웨이에서도 근로의욕 상실 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긴 안목을 갖고 눈앞의 욕구를 견뎌내며 자린고비 운영을 해 온 나라에서도 그렇다. 하물며 ‘후손의 몫을 마구 훔치는 나라’의 장래는 어떻겠는가.
이규연 논설위원



![[단독]만취 도주 롤스로이스男, 김태촌 뒤이은 범서방파 두목이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0bba3085-37bb-42a8-959c-5549e4e668a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