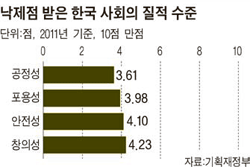
한국사회가 겉은 그럴듯한데 질적으로는 낙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공정하지도, 포용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창의적이지도 않다는 분석이다. 2020년에는 대체로 평균 이상으로 나아질 것이란 전망도 같이 나왔다. 하지만 공정성은 그때도 역시 과락(科落)일 것으로 전망됐다.
최항섭(사회학) 국민대 교수 등 19명의 연구진은 19일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미래전략을 세우기 위해 의뢰한 것이다. 연구진은 49명의 각 분야 전문가를 심층 면접해 사회 수준을 점수화했다. 만점은 10점이다. 5점이면 경제 발전에 상응하는 사회 수준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한국사회의 공정성은 3.61점에 불과했다. 4대 조사 분야 중 최저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와 재계 관계의 투명성(2.5점), 학벌의 공정성(2.57점), 지도층 인사 결정의 공정성(2.6점)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도층 준법 수준에 대한 평가는 3.81점이었다. 보고서는 8년 후에도 공정성은 큰 폭의 개선(예상 점수 4.92점)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평가는 3.98점이었다. 세부 항목에선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가 3.1점으로 최저였다. 미국·유럽인에 대해선 포용적이지만 동남아인에 대해선 배타적이었다. 탈북자·조선족에 대한 포용도(3.79점)는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3.36점)보다 조금 나았다. 그러나 2020년에는 탈북자·조선족에 대한 포용도(5.21점)가 동남아인(5.48점)만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전성은 평균 4.1점이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특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창의성 점수는 4.23점으로 4대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영화·대중음악·기술 분야의 창의성이 높다는 평가에 힘입어서다. 최항섭 교수는 “한국사회의 미래 지향은 개인이 ‘이 사회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공정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이재명, 김성태 모를수 없었다" 검찰이 법정서 꺼낼 세 장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5c26273a-19ad-4a25-b178-64b6fe1e8fcc.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