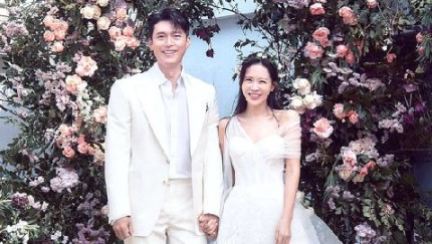1969년 8월 찌는 듯한 무더위와 씨름하며 부산 영도의 동삼동 패총발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지만 심신의 피곤을 풀 겨를은 없었다. 문화재관리국의 직제 개편을 앞두고 모두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바쁜 모습들이었다. 당시까지 비공식 직제이던 문화재연구실이 정식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문화재과처럼 중앙부처의 과 단위로 승격하기로 되어 있었다. 비공식기구이던 자료실도 문화재연구실 소속으로 바뀌게 됐다. 기구가 개편되고 담당자들이 자리바꿈하다 보니 당연히 인수인계할 사항들이 많았다.
드디어 69년 11월 16일. 대통령령 제 4203호로 문화재연구실이 발족됐고 초대 실장으로 당시 국립박물관 고고과장(考古課長)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정기(金正基)연구관(초대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현 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단장)이 부임했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장은 부산 부시장을 지낸 후 자리를 옮겨온 허련(許鍊)씨였다. 연구실이 발족되면서 사무실은 현재 경복궁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일제시대 건물인 2층 건물의 동쪽편의 절반을 사용했다.
연구실의 정식 기구 승격은 경주 지역의 매장 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해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불국사(佛國寺)를 복원(復元)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내 신상에도 변동이 있었다. 전문실 촉탁에서 연구실 촉탁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자료실에 근무하게 됐다. 임시조직인 자료실은 지금의 경복궁 자경전(慈慶殿) 건물을 사용했는데 간이 도서실 구실을 하는 정도였다. 자경전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아들을 고종으로 옹립한 조대비(趙大妃)가 거처했던 곳으로 광복 후 국립박물관 사무실로 사용됐다. 세월이 흘러 문화재연구실이 탄생하면서 다시 자료실 건물로 사용하게 됐다.
문화재연구실의 확대 개편은 당시 절대 권력자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특명' 때문이었다. 5월 朴대통령은 문화공보부(현 문화관광부) 신범식(申範植)장관에게 불국사 복원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 초도순시차 경상북도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국사 주지 이범행 스님이 "시주를 모아 불국사를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힌 게 계기가 됐다.
朴대통령은 훌륭한 일이라고 여겼고 정부에서 도울일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복원을 마치고 작성된 '불국사 복원공사 보고서'에서 발췌한 朴대통령의 복원 지시 문구는 경제발전과 일종의 뿌리찾기의 일환으로 전통 문화 창달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찾으려 했던 거창한 권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여 국운이 융성하고 국민이 화합하여 명상(瞑想)하고 이상(理想)하는 정신의 터전 위에 위용있고 기품있는 창조의 슬기가 어울려 우리 민족문화의 자랑찬 한 시대가 전개된 시기에 마련된 문화유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굴암(石窟庵)과 불국사인데, 민족문화 유산의 정수이며 신라 호국불교 정신이 깃든 깊은 도량이 불행하게도 임진왜란에 소실된 후 대웅전 등 건물 일부만 재건되었을 뿐 화려하고 장엄하던 옛 모습은 찾을 길 없이 나날이 퇴락돼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복원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을 기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호국의 정신을 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朴대통령의 지시내용은 일사천리로 이행됐다. 신범식 문화공보부 장관은 불국사 복원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경제인 간담회를 5월에 개최했고 6월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단법인 불국사복원위원회를 창립했다. 위원회 내에 전문학자들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불국사복원고증위원회가 설치되고 복원비용은 경제인들의 지원, 시주금 모금운동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고증위원회는 김정기 고고과장 등을 불국사 현지 조사위원으로 위촉했고 8월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8월 29일부터 발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김정기 과장은 처음 발굴조사를 주도하다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이 11월 정식 조직으로 신설되면서 초대 연구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국인 중 불국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석굴암과 함께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불국사의 모습은 30여년 전 복잡다단한 복원과정을 거친 후 가능하게 됐다.
정리=신준봉 기자
infor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