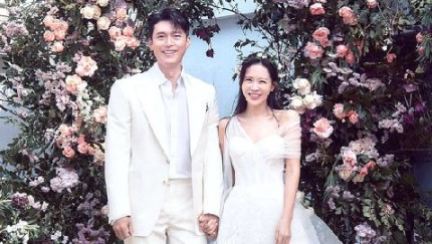강명관 풀어 엮음
푸른역사
456쪽, 2만3000원
가수 조용필의 노래 가사에서 서울은 ‘그리움이 남는 곳’이다. 급기야 서울은 ‘오 마이 러버’로 칭송된다. 이용의 노래에서도 서울은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곳인지라 ‘사랑하리라’는 경탄을 자아낸다. 서울은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이다. 시시각각 꿈틀대는 서울은 알고 보면 500살이 넘은 꽤 늙은 애인이다. 100살을 채 못 살다가는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저마다 얘기 보따리가 큼직하다는데 서울은 오죽할까. 그런데도 전문 연구자들 말을 들어보면 서울에 관한 자료가 흔치 않단다.
강명관(52)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또한 이런 갈증에 시달리다가 일제시대의 신문과 잡지를 훑어보며 목을 축이게 됐다. 그는 1910년 이후 신문과 잡지가 서울에 관한 특집기사를 많이 다룬 사실을 발견했다. 강 교수는 그 까닭을 “서울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1910년을 기점으로 일본인의 손에 의해 없던 길이 뚫리고 수백 년 묵은 궁궐과 관청과 성벽이 헐려나가고, 동리의 이름이 바뀌고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주거지의 성격이 달라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서울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강명관 교수가 100년 전 서울의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자료로 활용한 잡지 ‘별건곤’의 1933년 7월호 표지 그림. 예배당·카페·약방·영화관·호텔·바·이발소·요리집·양화점·냉면옥 등 일본 자본이 들여온 새로운 상품과 상업자본이 이전에 없던 광고라는 형식을 빌려 서울 사람들 삶 속에 들어왔다. [푸른역사 제공]
강 교수가 일일이 복사한 뒤 뽑아낸 자료는 잡지 ‘개벽’ ‘별건곤’ ‘조광’과 신문 ‘매일신보’ ‘동아일보’에 실렸던 서울 관련 기록이다. 조선총독부 기관지란 한계 탓에 사뭇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어조를 띤 ‘매일신보’를 제외하고 이들에 공통된 점은 조선시대에 서울을 경험한 사람들이 체험을 바탕으로 썼기에 생생한 느낌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구수한 입담 속에 걸쭉한 욕설이 섞이고 화류계 뒷방 사정이 얽히며 독자를 사라진 서울 속으로 데려간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1924년 6월부터 8월까지 ‘동아일보’에 50회에 걸쳐 연재된 ‘경성백승(京城百勝)’이다. 각 동리에 살고 있는 독자들이 써 보낸 동네 명물 사연을 사회부 기자들이 다듬어 엮었다. 당대의 문장가인 벽초 홍명희와 위당 정인보가 기획을 한 만큼 내용이 충실하고 해학이 넘친다. 일종의 풍물지이자 인류학 보고서다.
조선왕조 500년의 흔적을 보존해온 서울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인 손에 의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1890년대(왼쪽 사진)와 1910년대 운종가. 운종가는 동대문에서 돈의문을 지나는 서울의 중심축으로 상업의 중심지였다. 오른쪽 사진에서 전차 개통 뒤 확연히 변한 운종가 주변 풍경을 확인할 수 있다.
“광희정(光熙町) 사람 말이 내 동리 명물은 파리다. 어느 집을 가보던지 사람의 집이라느니 보다 파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할 만큼 파리가 숱하게 많다고 합니다. 파리는 추한 곳에 많이 생기는 물건이니 파리를 명물로 내세우는 것은 동리가 추하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울 성곽의 역사를 성벽에 새겨진 문자를 통해 추적한 ‘성벽문학’, 신분과 직업에 따라 모여 사는 주거지가 달랐음을 전하는 글 등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 자료도 책 곳곳에 흩어져있다. 강 교수 자신이 “사라진 서울에 대한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작은 자료집일 뿐”이라고 표현한 대로 이쪽 분야에 관심을 지닌 이들에게 생각을 키워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책을 읽다보면 문득 100년 전 서울을 거닐며 사랑을 나누었을 ‘모뽀(모던 보이)’와 ‘모껄(모던 걸)’의 모습 위에 오늘 우리의 얼굴이 겹쳐진다.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그 마음은 여일하리라. 가가(呵呵)!
정재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