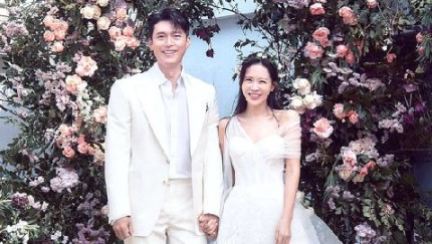지난 94~96년 경제상황은 정부가 정책대응의 때를 놓쳐 위기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94년 들어 한국경제는 92~93년의 경기침체를 딛고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당시 경제회복은 이전의 극심한 경기위축에 따른 반등의 시점에 정부가 '신경제정책' 을 표방하며 경기부양적 정책을 밀고 나갔던 게 주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95년 들어 뜻하지 않은 엔고(高)뒷바람속 반도체 특수(特需)를 맞아 국내 경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총량적 지표만 바라보며 경제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내실을 다지는 정책은 외면했다.
겉으론 '경기 연착륙(軟着陸)' 을 얘기하면서도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했고 기업들이 마구잡이식 외자유치로 무모한 투자에 나서는 것도 통제하지 않았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은근히 원화가치 절상을 부추겼다. 너도 나도 부자가 된 듯 해외여행을 떠났고 비싼 외제품을 사들여 수입을 부추겼다.
'세계화' 의 기치 아래 마치 선진국에 진입한 듯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단기 고성장 아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뿌리박힌 가운데 반도체 경기가 시들해지자 남은 것이라곤 '거품' 뿐이었다. 96년 경상수지 적자(2백37억2천만달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외채가 1천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품으로 포장된 거시지표만을 제시하며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에 문제가 없다" 는 소리만 반복했다. 결국 외환위기를 맞았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급전을 구해다 불을 끄는 파국을 초래했다.
95년 1만달러를 넘어섰던 1인당 국민소득은 2년 만인 97년부터 1만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경제정책에 참여했던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이러다간 위기를 맞을 것이란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대세를 거스르긴 힘들었다" 며 "특히 97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상황이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 고 털어놓았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