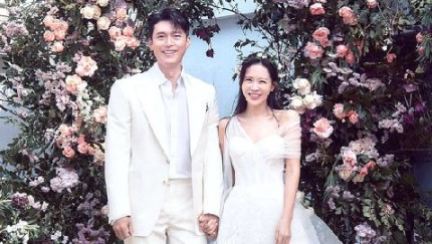하지만 이러한 외국사례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웃집 얘기로만 남아 있다. 특히 그동안의 미디어법을 둘러싼 공방을 지켜보면, 전 세계적인 미디어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가 시급히 수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 대안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단지 언론악법이라고 프레이밍한 쪽의 반대 주장만이 어젠다를 주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여당 역시 국민에게 미디어법에 담긴 내용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동안 국회나 학회에서 주관한 수십 차례의 공청회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중요한 쟁점들은 대부분 지적됐다.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경우 거대 자본에 방송이 예속되고 여론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언론의 공공성과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옳은 얘기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미디어의 공익성을 높이면서도 산업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0일 넘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를 운영해 보았지만 동어반복적인 주장만 나오다 끝나 버렸다. 그나마 얻은 것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방송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을 의식, 이를 디지털방송 전환 시점인 2013년 이후로 유예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장치’도 명문화하겠다는 여당의 수정된 내용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던 야당 역시 지난 9일 미디어법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고 현실적 설득력도 떨어진다. 민주당안의 핵심은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대기업과 언론사의 진출을 현행처럼 금지하고, 보도기능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에는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이나 시장지배력 10% 미만의 신문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신문사 중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 것인가? 보도기능을 갖춘 방송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데 이들 중에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10여 일 남은 임시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 표명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보다도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어 TV시청에서부터 인터넷 검색까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 독점과 방송장악이라는 아날로그적인 단순 프레임으로, 일단 길을 막고 보자는 의도는 위기의 미디어산업을 더욱 궁지에 모는 행위다. 이번엔 미디어법이 통과되어 공익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