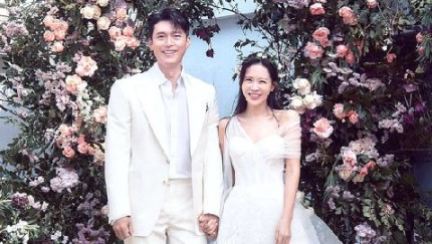우리 영화의 유머 한 토막. 충무로의 베트남전은? 대종상! 온갖 해법이 등장하고 기업이 나서서 떠안고, 젊은 영화인들이 풀어내기 위해 뛰어들고, 백서가 나오고, 그래서 심지어 '대종상이 잘 치러지는 순간 한국 영화의 모든 문제는 풀릴 것이다' 라는 예언마저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대종상은 점점 꼬여만 갔다.
계속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겨났고, 매년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터졌다.
이번으로 35회를 치른 대종상이 아무 '잡음' 없이 무사히 넘어갔던 해는 아마 단 한번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올해는 지난해까지 후원해오던 삼성이 손을 떼고 쌍방울개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한편 무주리조트에서 말 그대로 '축제' 의 형식으로 9월27일부터 일주일간 열렸다.
이번에는 '정말' 잘 되었으면 했지만…. 하지만 이 소망은 그저 바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우선 무엇보다도 시기를 잘못 선정했다. 올해 대종상은 10월10일부터 시작하는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바로 직전에 잡혀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는 아마도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난 일년간 전세계 영화계로부터 화제가 되었던 1백77편의 작품을 끌어모은 국제영화제와 경쟁하려는 것은 애초 무리 아니었을까. 게다가 대종상을 '일주일의 축제' 로 만들기 위한 모든 시도가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지리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 점이 안타깝다.
가을 정취를 느끼며 무주에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영화팬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는 낮은 자리에 있는 영화인들에게조차 '머나먼 행사' 처럼 다가섰다.
그러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매년 그랬던 것처럼 작품 선출방식이었다. 올해에는 36편의 접수작품을 대상으로 예심을 거쳐 본선진출 15편을 선정하였고, 여기서 20개 부문 후보 다섯편을 다시 뽑아서 수상작을 결정했다.
두가지 의문이 있다. 그 첫번째 - 대종상이 명실공히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영화상이라면 나는 왜 이 상의 후보 대상작들이 지난 일년간 한국에서 개봉한 모든 작품들이 아니라 접수작품으로 제한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대종상은 저예산으로 만드는 그 모든 비제도권 영화의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재능과 도전을 놓쳐버린 것이다.
두번째 의문 -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15편의 영화로 후보를 압축시켜 놓은 다음에는 20개 부문으로 '나눠먹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아함이다.
예를 들면 작품상이나 감독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 (의상.음악.미술.음향기술 또는 그외) 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영화 자체는 '형편 없어도' 부문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테면 아카데미상의 경우 기술부문은 대부분 작품상이나 감독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화들이 수상한다.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닐까. 대종상은 충무로 제도권 바깥으로도 폐쇄적일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매우 제한된 방식을 선택하였다.
게다가 이번에는 일반 영화 관객들로부터도 너무 먼곳에 있었다. 만일 대종상이 일부 동네잔치가 아니라면, 좀더 넓게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거리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누구나'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직은 가야할 길이 먼 것 같다.
정성일〈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