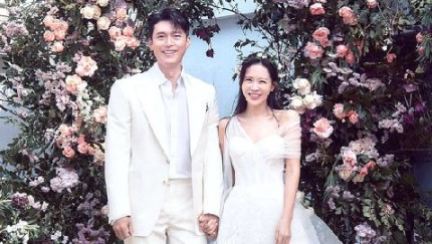더욱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협소한 인재풀이나 정책의 경직·편향성 때문이기도 하다. 외교안보통일 부처 수장이나 비서관들의 면면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관리 능력을 의심케 한다.
외교 전문가는 존재하나 남북관계 전문가는 없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외교와 국제공조만으로 남북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교부 혹은 외교부 출신 관료들만의 눈에 띄는 위상 강화 현상도 우려스럽다. 또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여전히 많은 이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한·미 관계를 강조하는 것 빼고는 새 정부가 북한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풀어 나갈 정교한 전략과 전술을 읽을 수가 없다.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다소 추상적 비전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다. 새 정부는 ‘비핵 개방’이라는 조건만 내세웠지, 현실적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일부의 시각처럼 4월 총선 승리만을 겨냥한 제스처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과시하기 위한 포석인지는 알 수 없다.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애써 부각시키고 있고, 작심하고 북한 길들이기에 나선 듯하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에 올인하고 있는 듯하다. 평가의 초점은 이런 초기 접근방식들이 과연 당면과제인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북한을 압박할 적절한 시점인가에 대해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임기 말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북핵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고, 3월 말까지 북한의 완전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 때다.
한·미 간의 역할 분담에 따른 계산적 대응인지는 모르나, 새 정부가 북한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다소 산만하고 혼란스럽다. 과거 정부들도 예외 없이 초기에 과잉 의욕을 보이면서 차별적 접근을 시도했지만 교훈은 거의 비슷했다. 한·미-남북-북·미 관계가 선순환되어야 현상유지를 뛰어넘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경험적으로 볼 때 한·미 관계를 개선하려면 어느 정도의 남북관계 긴장을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면 한·미 관계가 불편해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마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trade-off)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
새 정부가 어느 한 가지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면, 정책결정자는 균형 잡힌 정책 조합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공조에만 초점을 맞춘 편향된 인사와 정책은 피해야 한다. 또한 한꺼번에 북한과 관련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해 소모적인 갈등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핵심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정책 조합을 만들어 시기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기 발생 시 가동할 수 있는 상호 신뢰할 만한 남북대화 채널 하나쯤은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