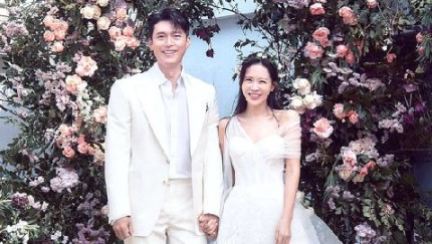올해는 가을이 더디게 왔다. 은행잎들도 가로수들도 이제야 노랗게 물들어 간다. 한편으론 늦게 와준 가을이 다행스럽다. 어이없는 사랑과 야망과 거짓의 드라마에 우리 모두 너무 오래 붙들려 있지 않았던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시월과 가을을 아예 다 뺏길 뻔했다. 이제 계절로 눈을 돌려 귀를 좀 씻어 내자. 마음을 좀 채우자.
가을꽃의 대표 격인 국화는 한 송이 안에서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이뤄지는 가장 진화된 꽃이라고 한다. 촘촘한 속 부분은 국화의 생명을 좀 더 크게 책임지고, 길쭉길쭉한 바깥쪽 꽃잎들은 국화꽃이라는 개성을 책임진다는 거다. 가을엔 사람도 외부로 발산해 버린 기운을 다시 내면으로 끌어들여 내면을 따뜻하고 조밀하게 채워야 한다. 그래야 겨울이라는 바깥 추위도 견딜 수 있고, 개성이라는 자신만의 고유성도 키워 갈 수 있다.
그런 조밀함을 위해 우선 시집 읽기를 권하고 싶다. 시가 어렵다고 하지만 황동규 시인의 ‘시월’을 찬찬히 읽어 본 적이 있는가. “내 사랑하리 시월의 강물을 / 석양이 짙어가는 푸른 모래톱 / 지난날 가졌던 슬픈 여정들을, 아득한 기대를”로 시작되는 시. 그 시를 처음 읽은 건 대학도서관에서였다. 한 구절 읽고는 도서관 창밖의 어둠을 한참씩 내다보고는 했다. 그러다 마지막 연의 “창밖에 가득히 낙엽이 내리는 저녁 / 나는 끊임없이 불빛이 그리웠다”에 이르러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잔뜩 사무친 마음으로 불빛 없는 도서관 뒷산을 올랐다. 그러곤 여러 모로 불행하던 마음을 다독였다. 이런 시가 있고, 낙엽 쏟아져 내리는 가을이 있고, 책들이 쏟아 내는 저 따뜻한 불빛이 있으면 됐지, 어느 것도 내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내 것일 수 있는 저들이면 됐지, 다독이고 어둠 속을 내려왔다. 그때의 발자국 소리들 아직도 가끔씩 들려온다. 뭔가에 지나친 욕심을 내거나 화를 낼 때 죽비처럼 마음을 쳐주는 것이다. 그런 시 한 편, 시집 한 권, 그런 발자국소리 하나쯤 이 가을에 꼭 챙기시면 좋겠다.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는 노래와 음악도 빼놓을 수 없다. 유행가는 한 사람이 어느 연도나 연대를 살았는지를 증거해 주는 가장 강력한 추억의 증명서이자 사진첩이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지나간 유행가를 듣게 될 때, 가령 내 연배라면 송창식의 ‘날이 갈수록’이나 윤정하의 ‘찬비’ 같은 걸 우연히 듣게 될 때, 당장 좌르륵 펼쳐지는 추억의 사진첩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노래 자주 듣던 무렵의 찻집 이름에서부터 그 무렵의 심정까지, 가을비 내리면 무조건 모인다는 ‘찬비클럽’을 만들던 식의 치기까지, 모든 게 일시에 돌아오는 걸 보게 된다. 아직 20~30대인 이들은 불과 일 년 전의 유행가에 그렇게 발을 멈추고 지난해 가을의 긴 추억에 빠지리라. 그런 추억의 순간들이 소중한 건 그들에게 마음을 맑고 투명하게 풍화시켜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유행가에 비하면 클래식 음악은 어제의 추억과 오늘의 감상을 함께 유지할 수 있어 좋다. 가령 20대에 열심히 들었던 마리아 칼라스가 부른 도니제티의 오페라 ‘라메르무어의 루치아’에 나오는 광란의 아리아(Scena dalla pazzia)나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그 시절을 되살 수 있을 듯한 착각을 주고, 처음 듣는 음악인 듯 귀와 마음을 새롭게 열어 주기도 한다. 고전만이 갖는 위력일 것이다.
이 가을 유난히 폴 포츠와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파바로티의 노래가 듣고 싶다. 폴 포츠는 휴대전화 판매원이었다가 영국판 ‘전국노래자랑’에서 스타가 된 이다. 두 사람의 아리아를 비교해 들으면서 인생의 반전이나 생로병사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구색을 갖추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시와 음악 못지않게 그림도 중요한 목록이겠다. 여하튼 올해 가을은 더디게 온 만큼 더디게 보내자. 가을의 샛노란 국화 속처럼 마음에 자신만의 ‘예술문화 목록들’을 보다 촘촘하고 풍성하게 채워 넣자. 그리하여 이 가을을 넉넉하고 푸근하게 만들자. 그게 가장 옹골차고 위대하게 가을을 나는 법 아닐까.
김경미 시인·방송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