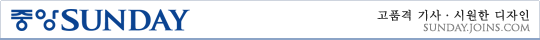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하기는 대화다. 대화란 두세 사람 이상이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타인이나 상황변화에 따라 얘기의 흐름이 끊기거나 달라질 수 있는 자유분방한 말하기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연설 같은 공적인 스피치와 달리 끊기는 것이 당연하다. 대화는 네트를 넘는 탁구공처럼 오가면서 굽이굽이 흐르는 것이다. 내가 결코 주인공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인공이었다가 조역이었다가, 단역이나 관중이 되기도 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주고받는 대화라고 해서 아무 형식이 없거나 쉬운 것은 아니다. 공적인 말하기를 주로 하는 직업의 사람일수록 사적인 대화의 순간에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공적인 스피치는 준비된 것이며 일방적이어서 자신이 대부분의 내용과 형식을 주도할 수 있는 반면 대화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강의나 방송보다 참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 좀 거리가 있는 사람과의 형식적인 대화가 훨씬 힘들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단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시작의 단계. 만났을 때 어떻게 지냈느냐는 등의 인사말, 악수와 미소, 손 흔들기 등 반가움의 표시가 대화의 시작이다. 전화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랜만이다’ ‘잘 있었니’ ‘그래, 건강은 좋아’ 등. 대화를 시작하는 인사는 늘 긍정적인 쪽이 좋다.
두 번째 도입, 혹은 예고의 단계. 대화가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 기본적 윤곽을 상대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대화의 톤이 어떠할 것인지 감을 잡도록 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야’ 혹은 ‘누구누구에 대한 얘긴데 조심스럽긴 하다’ 등의 말이 오갈 수 있다.
세 번째 본론. 대화의 실질, 초점이 되는 부분이다. 간단히 용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가끔 이 본론을 짚지 못하고 빙글빙글 도는 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행태는 서로를 피곤하게 한다.
네 번째 피드백의 단계다. 용건이 끝났다는 신호다.
마지막으로 끝인사. 대화를 요약하고 마감한다. 대개 대화를 반추하고 요약하며 ‘즐거운 대화였어’라는 가벼운 감상을 말하거나, 즐거운 대화를 지금 계속하지 못함의 양해를 구하고, 또 다른 대화의 기회를 암시하곤 한다. 모든 대화가 이렇듯 확실한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몇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한번 되돌아보자. 반가운 인사로 시작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감을 잡고 대화를 마친 후 다음을 기약하는 따뜻한 끝인사로 이어졌던 대화의 시간을. 반대로 다짜고짜 용건으로 들어가는 사람, 자기 할 말만 끝내고 자리를 뜨거나 전화를 끊는 상대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던 기억도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별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다시 얘기를 하고 싶어지지도 않는다. 어느 정도의 단계를 밟아 용건을 마치는 대화가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기억을 남긴다.
사실 누구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 계기를 곰곰 생각해보면 그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상대에 대한 배려와 친절, 경청하는 자세 등에서 호감이 비롯됐다는 걸 깨닫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초등학교 고학년 소녀에게 대화의 단계나 방법들을 알려주고 익히게 하자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호감을 얻기 시작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어찌 보면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로서의 나는 나의 외연만이 아니라 나 자체일 수 있다.
유정아씨는 현재 KBS 1FM ‘FM가정음악’을 진행하며, 서울대학교에서 말하기를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