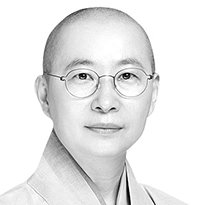
원영 스님 청룡암 주지
한창이던 벚꽃의 유영(遊泳)이 안간힘을 쏟아내며 막바지에 이를 무렵, 아쉬움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어느 신도께서 야생화에 시를 곁들인 책 한 권 선물로 갖다 주셨다. 아련한 기억을 품은 라일락 닮은 수수꽃다리 표지가 맘에 쏙 들었다. 자연에는 참 많은 꽃과 나무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잊고 지낸다. 자연이 내어주는 것들에 기대어 일생을 살다가 감사함을 잊은 채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도시에 살건 시골에 살건 관계없이 인간은 대체로 받기만 하다가 훌쩍 떠나는 삶을 사는 것 같다.
받기만 하다가 훌쩍 떠나는 삶
모든 것 연결됐다는 사실 잊어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건 몽상

김지윤 기자
오래전에 일본 동북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다. 그곳 숲속을 정처 없이 거닐면서 나무가 뿜어내는 천연의 피톤치드 향기에 취해 나조차도 나무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하늘을 다 가릴 정도로 쭉쭉 뻗은 나무들, 그 많은 나무 덕분에 당시 나를 옥죄어 오던 논문 탈고의 압박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제대로 된 숨을 크게 쉴 수 있었다.
그러나 다시 일상 터전으로 돌아와서는 감사함을 금세 잊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만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 다른 이들 덕분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주 까먹고 살아간다.
매우 식상한 말일 수 있겠으나, 우리는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어느 누구라도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어야 하며, 대자연 속의 일부로 세상에 머물다가 때가 되면 소멸해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無常), 무아(無我), 연기(緣起)의 가르침으로 설명한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무상’의 원리로, 나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무아’,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으로 설명한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매우 보편적이어서 꼭 불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에는 ‘우분투(Ubuntu)’라는 철학 개념이 있다. 컴퓨터 운영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우분투’는 남아프리카 줄루족과 코사족의 반투어 인사말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즉 당신 덕에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인들의 전통적인 사유방식이다. 모두가 힘든데 나 혼자 행복할 수 없고, 모두가 즐거운데 나만 쓸쓸하게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담겼다. 음식이 있으면 나누어 먹고, 힘들면 손잡고 함께 가자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분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추모사를 남겼다고 한다.
“남아프리카에는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넬슨 만델라가 남기고 간 가장 위대한 선물을 잘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묶여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또한 인류는 하나라는 깨달음이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세계여행에서 찾은 20가지 행복철학』중에서)
인류는 하나라는 깨달음인 ‘우분투’나, 나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무아’의 개념, 이런 좋은 가르침들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은 분명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대개가 바르게 보지 못하고 편견이나 선입견, 그리고 이기심으로 왜곡해서 보거나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반야심경』 구절 중에 ‘뒤바뀐 헛된 생각으로부터 멀리 떠나라(遠離顚倒夢想)’는 말이 있다. 남들이 힘들게 살아도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뒤바뀐 헛된 망상’인 ‘전도몽상’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기에,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또 거기서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 뒤바뀐 생각들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친다. 다른 이들 덕분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저 잘나서 잘사는 줄 안다. 이 모두가 전도몽상이다.
‘처음처럼’의 신영복 교수는 저서 『더불어 숲』에서 “우리는 어린 손자의 모습에서 문득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손자를 통해 할아버지가 계승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비단 혈연을 통한 계승뿐만 아니라 사제(師弟), 붕우(朋友) 등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윤회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은 누군가의 생을 잇고 있으며, 또 누군가의 생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라며 ‘나’란 존재가 혼자만의 힘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마감하는 게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은 생성과 소멸이라는 대자연의 윤회, 그 대자연의 일부인 인간에게는 관계의 윤회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 같다. 자연 대 인간, 인간 대 인간.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원영 스님 청룡암 주지



![[단독]만취 도주 롤스로이스男, 김태촌 뒤이은 범서방파 두목이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0bba3085-37bb-42a8-959c-5549e4e668a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