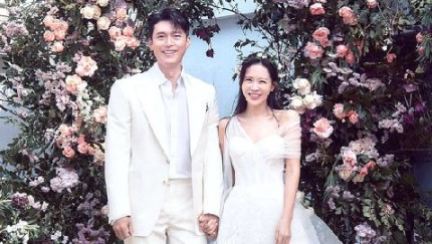시인에게서 겨울을 보는 건, 눈 내린 아침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 벌판을 느끼는 건, 세상과 어긋난 시인의 걸음걸이를 알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래서일 것이다. 누구는 시인을 아나키스트라 하고, 또 누구는 테러리스트라 부른다.
앞서 인용한 '금줄'이란 시를 보자. 며칠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 베란다가 개구리 뛰놀고 달팽이 기어다니고 금붕어 헤엄치는 곳이 돼버렸다. 수돗물 마시고 배합사료 받아먹는 생명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 모양이 하도 기특해 금줄이라도 치려는 것이다.
언뜻,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예찬으로 읽힌다. 그러나 시인은 한 발짝 더 나아간다. '도시 바깥을 낯설어하며/야생을 두려워하며/…/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우리들 사람이 제일로 무지한 것'이 '엄연한 생태'라고, 시인은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시인은, 도시문명이 싫은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올 봄에 발표한 '내가 어디 멀리 다녀온 것 같다'는 메시지가 보다 분명하다. '죽어가는 것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대량생산은 국경을 넘나들며 여전히 혈기왕성했다/…/민주주의는 소음과 똑같은 소음의 대결이었고/…/혁명은 여전히 냉장고와 좌변기 사이에 있었다'.
사회에 대한 환멸까지 느껴진다. 시인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한다. '시 잘 쓰는 시인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해야 하는데/아직도 여전히 시인과 농부가 맨 끝 인류의 마지막이었다/아무래도 내가 어디 멀리 갔다가 온 것이다'.
시인이 처음부터 모질었던 건 아니다. 지난 세기만 해도 그는 농경문화의 옛 기억을 길어올리고, '마음의 오지'를 찾아 홀로 길을 떠나곤 했다. 하나 21세기에 들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달라진 모습이 두드러진 건, 이태 전 출간된 네 번째 시집 '제국호텔'에서였다. 그때부터 시인은 "이미지보다 메시지에 충실한 시편"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해 가을, 시인은 다음과 같이 속내를 드러낸다.
'마흔에 가까워지면서 북북서진이라는 낯선 표현이 내 안에서 스며나왔는데, 그것은 뒤늦게 드는 철 같은 것이었다. 북북서진은 나의 정체성과 직결된 이미지였으니, 나는 실향민의 아들이었다. … 당분간 시가 무거워질 것 같다.'
어느 술자리에서였다. 술에 취한 시인은 "80년대엔 내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제일 앞에 있더라"고 중얼거렸다. 며칠 전에 다시 물었다. "그 줄 얘기, 여전히 유효하지요?" 시인은 겨우 답했다. "제일 앞은 아니고, 뒤에서 서너 번째 정도일 거야."
시인은 천생이 여리다. '내가 홀로 서지 못해/내가 홀로 있는 것이다'('독거' 부분)며 늘 제 탓만 한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지구 위의 사람들'과 '가난하고 헐벗고 아픈 지구인들'('보름달 떴다!' 부분)만 시인의 눈에 밟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보다 앞에 서게 됐고, 그러다 보니 겨울 벌판에 홀로 나와있게 된 것이다.
소설가 고종석이 시인을 두고 이른 말이 있다. '이문재의 얼굴에는 달콤한 불행 의식으로 생을 버티는 70년대 젊은이의 표정이 있다.' 아무리 읽어도 맞는 말이다.
손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