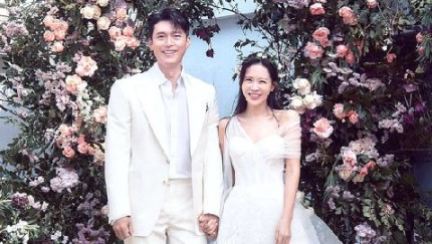전경련 1백대 기업 조사
국내기업들이 생산설비투자를 외면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산업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한은의 자금순환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기업들이 산업활동보다 돈을 굴려 재미를 보는 이른바「재테크」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반면 전경련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설비투자 분석에서는 자금부족 때문에 투자 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좋은 대조를 보였다.
국내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원화절상·원자재 값 인상·임금인상 등 3고의 영향으로 연초 계획했던 시설투자규모를 축소 조정하거나 하반기로 넘기는 등 투자활동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공업과 비 제조업분야는 오히려 투자를 확대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전경련이 1백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설비투자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설비투자를 지난해보다 21·5%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를 20·5%로 축소 조정했고 투자진척비율도 4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부문은 당초 23·8%증가계획에서 22·1%로 축소 조정한 반면 비 제조업부문은 14·8%에서 15·5%로 오히려 투자계획을 확대 조정한 것으로 조사돼 제조업투자 둔화, 비 제조업투자 활성화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제조업 중 중화학부문은 23·2%에서 20·2%로 축소 조정했지만 경공업분야는 27· 5%에서 35·0%로 확대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진척비율을 보면 목·제지(24·6%), 석유화학(32·7%), 전기·전자(40·2%) 등의 부문이 특히 저조했으나 음 식료품(54·9%) 비금속(50·5%) 등의 부문은 시설투자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투자가 이처럼 부진했던 이유로는 투자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한 업체가 전체의 23·7%로 가장 많아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원자재 값 상승 17·3%, 원화절상 13·3%, 임금인상 10·8%, 국내수요부진 10·5%의 순서로 나타났다.
업종별 투자조정 내용을 보면 석유화학(36·8%↓28·9%) 전기전자(12·3%↓8·9%) 비금속(22·7%↓12·9%)부문 등은 투자 계획을 축소했으나 음 식료품(6·6%↓17·1%) 섬유의류(33·5%↓40·5%) 기타조립금속(31·9%↓48·2%), 건설업(45·3%↓61·5%)은 확대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제조업보다는 비 제조업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조 조달 37%만 재투자>
한은, 자금순환 동향
상반기 중 국내기업들은 증시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설비투자를 줄이는 대신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유가증권 및 제2금융권 상품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기업들은 어음 및 주식발행을 통해 13조3천3백억 원(작년대비 62%증가)의 자금을 조달했으나 이 가운데 시설투자에 충당한 것은 37%(4조9천억 원)에 불과, 노사분규로 인한 투자위축 현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와 함께 수출호조에 따른 수익증대 분 등으로 고 수익 금융상품을 늘려 상반기 중 금융자산증가 폭은 작년 동기대비 2배가 넘는 8조4천억 원에 달했다.
개인부문은 소비가 늘고 물가 불안심리가 높아 여유자금이 부동산 등으로 몰려 금융자산증가폭은 작년대비 2·6%에 그친 9조7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개인부문 금융자산은 유가증권 매입에 4조7천억 원(작년대비 2·6배 증가) 쓰였으며 1, 2금융권저축은 작년보다 2조4천억 원 줄어든 4조9천억 원 증가에 그쳤다.
정부부문 금융자산은 세수호조에 힘입어 3조4천7백억 원(전년대비 9·5%증가) 늘었다. 이로써 국내 비 금융부문(가계·기업·정부) 금융자산증가 폭은 작년대비 30·8% 늘어난 21조5천5백57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늘어난 금융자산은 어음·주식 등 유가증권매입에 8조2천7백억 원(작년 동기대비 1·7배 증가) 쓰였으며, 금융기관 예금에는 10조4천4백억 원(작년대비 5·2%감소)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