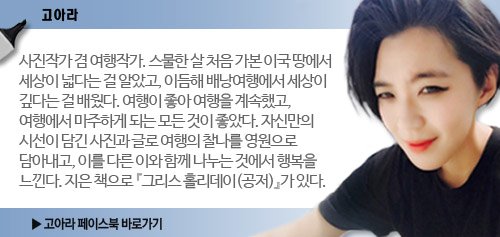아이슬란드 여행의 마지막은 골든 서클(Golden Circle)로 장식하기로 했다. 골든 서클이란 싱벨리어 국립공원(Þingvellir National Park), 게이시르 지대(Geysir), 굴포스(Gullfoss)를 둘러보는 루트다. 3곳 모두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멀지 않은 데다 아이슬란드의 독특한 자연풍광을 다양하게 품고 있어 그야말로 알짜배기 루트라 할 수 있다.
시계방향으로 섬을 돌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던 터라 서쪽에 있는 게이시르를 시작점으로 삼았다. 링로드를 타고 셀포스 마을을 거쳐 북쪽으로 올라갔다. 게이시르로 가는 길목에는 케리드(Kerið)라는 분화구가 있었는데 잠시 들러보기로 했다. 아이슬란드를 한 바퀴 돌며 처음으로 입장료 2유로를 지불했다. 핫도그도 3유로를 넘는 마당에 화산 분화구 관람료가 단돈 2유로라니. 돈을 쓰면서 감동하기는 처음이었다.

약 6500년 전에 형성된 케리드 분화구는 타원형이다. 너비 170m, 깊이 55m로 규모도 제법 큰 편이다. 붉은 화산암이 가득한 분화구를 한 바퀴 걸은 후 호수로 내려갔다. 아쿠아 색 호수의 모습이 마치 마법의 거울을 보는 듯 신비로웠다.
게이시르 지대로 발길을 옮겼다. 일대는 온통 연기와 유황 냄새로 가득했다. 수십 개의 웅덩이에서는 온천수가 부글부글 끓어 오르고 있었다. 게이시르는 우리말로 간헐천이라 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하에서 열수나 수증기가 하늘 위로 솟구치는 온천을 뜻한다. 간헐천이야 세계 곳곳에 있지만, 아이슬란드의 간헐천은 남다르다. 10여 분 간격으로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시간 촉박한 여행자라 할지라도 일단 이곳에 오기만 하면 허탕 치고 갈 리는 없다는 뜻이다.
게이시르 지대에는 2개의 주요 간헐천이 있다. 하나는 그레이트 게이시르(Great Geysir), 다른 하나는 스트로쿠르(Strokkur)다. 그레이트 게이시르에서 쏘아 올리는 물기둥은 최대 80m에 달했으나, 1916년 느닷없이 활동을 멈췄다. 현재는 다시 분출하기 시작했지만 언제 터질지 장담할 수 없는 반수면 상태이다. 반면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스트로쿠르는 규모는 작지만 5~10분에 한 번꼴로 물기둥이 솟구친다.

간헐천 앞에 모인 군중은 말이 없었다. 다들 숨죽인 채 물이 중력을 거스르기만 기다렸다. 나 또한 카메라를 부여잡고 부동자세를 하고 있었다. 5분이 지났을까. 웅덩이가 꼴깍거리더니 굉음과 함께 엄청난 높이의 물기둥이 순식간에 솟아올랐다. 너무 놀란 나머지 사진 찍는 것조차 잊었다. 사람들은 박수 치며 환호했다. 자연만이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쇼에 감동과 흥분이 물밀듯 밀려왔다.

게이시르를 떠나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굴포스로 이동했다. 굴포스는 아이슬란드어로 황금 폭포라는 뜻이다. 햇빛이 비출 때마다 물결이 황금빛으로 반짝인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길을 따라 내려가자 굴포스가 찬란한 모습을 드러냈다. 랑요쿨 빙하에서 발원한 흐비타 강물이 32m 높이의 거대한 협곡 사이로 두 개 층을 이루며 낙하했다.

굴포스의 형태는 이상할 정도로 신기했다. 넓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방향을 꺾어 좁은 절벽 사이로 쏟아졌다. 독특한 지형 때문인지 보는 각도에 따라 폭포의 모습이 달라졌다. 트레일을 따라 굴포스 옆으로 바짝 다가섰다. 위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 모양이던 폭포가 아래에서는 갈라진 대지 틈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거센 물살이 코앞까지 달려들었다. 사방은 깨지는 듯한 물소리로 가득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를 뜨거운 감정이 끓어올랐다. 그리고 생각했다. 황금빛 폭포를 보게 된 것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

다음날 이른 아침, 골든서클의 종착지 싱벨리어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여행의 피날레를 축복하듯 날씨가 무척 화창했다. 레이캬비크에서 싱벨리어 국립공원까지는 자동차로 약 40분. 창밖에 펼쳐진 평원이 유난히 눈부셨다. 싱벨리어에 도착하니 성벽처럼 길게 늘어선 용암 절벽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싱벨리어는 아이슬란드 역사에서도 각별한 장소다. 세계 최초의 민주 의회라고 일컬어지는 ‘알싱(Althing)’이 개최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930년부터 1798년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아이슬란드의 법이 만들어지고 온갖 주요 분쟁이 중재되었다.

싱벨리어가 유명한 이유는 또 있다. 북아메리판과 유라시아판이 바로 이곳에서 만난다. 자세히 보니 정말 쩍하고 갈라진 ‘지구의 틈’이 보였다. 두 발로 두 개의 대륙판을 걷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 틈은 매년 2㎝씩 더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살아 움직이는 지구를 목격하고 있는 셈이었다.

레이캬비크로 돌아가기 전, 전망대로 향했다. 갈라지고 솟아난 대지와 고요한 싱발라바튼 호수, 낮게 깔린 구름, 그 뒤로 솟아오르는 증기 그리고 바다가 보였다. 지극히 아이슬란드답고 지독히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끝까지 감탄만 하며, 아이슬란드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쳤다.


![[초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평균 연령 67세, 최고령 87세…“이곳이 인생 2막 출발점이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74a81d39-04ad-4d10-8a8a-47f51a081a28.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