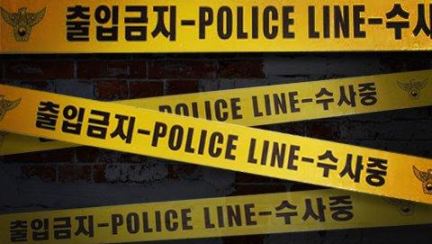양선희
양선희논설위원
5월 수출증가율 -10.9%. 모든 사회적 이슈를 잡아먹은 초특급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만 없었다면 근자엔 ‘한국 수출의 추락’에 대한 담론이 왕성했을 거다.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다 급기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추락을 했기 때문이다.
한데 이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의 반응은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다.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자료에도 ‘단기적 요인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라고 짚는다. ‘수출 회복이 어렵다’는 말이다. “10년 전부터 이럴 거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비를 못한 거죠.” 한 무역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한탄을 한다. 실은 무역업계 취재기자였던 나도 알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수출산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꾸준히 나왔다. 중국의 한국 산업 모방형 성장전략은 큰 위협요인이었다. 내 경우도 석유화학·전자·철강 등 우리 수출산업과 겹치는 부문에서 중국이 과잉 설비투자를 시작한 실태를 보도했던 ‘중국경제대장정’ 시리즈를 내놓은 게 2001년이다. 2007년엔 한·중·일 삼국 산업구조의 겹침을 우려하며 산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샌드위치 코리아’ 시리즈를 잇따라 기획보도했다.
한·중·일 샌드위치 구도를 탈피하는 산업구조조정, 신수종산업 개발, 내수기반을 다지기 위한 서비스업 발전과 규제개혁 등 각종 대안이 학계·업계·언론계에서 쏟아졌다. 그러나 우리 수출전략은 1960년대 경공업 위주에서 70년대 중화학 육성으로 노선을 바꾼 뒤 40여 년간 ‘일로매진’이다. 업계는 관성처럼 하던 걸 계속했고, 산업·경제 정책도 미래보다는 현실에 안주했다. 그동안 위험 운운하는 게 호들갑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수출이 잘됐으니 그랬던 측면도 있다.
한데 이런 수출호황은 중국이 경제발전 과정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대량 수입하면서 생긴 착시현상의 측면이 강했다. 경제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착시라는 걸 전문가들도 알았다. 모여 앉으면 걱정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엔 세계 무역규모 축소로 수출주도 성장은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고 예견했었다. 지금의 수출 부진, 경제적 어려움은 모르고 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다.
돌이켜보면 우린 구조조정을 해야 했던 ‘골든타임’을 세월호 침몰 당시 멀뚱거리며 구조 기회를 놓쳤듯 그렇게 흘려 보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위기를 자초하는 게 우리 사회의 행동 패턴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패턴엔 ‘일관성’이 있다. 눈뜨고 놓친다는 것. 일을 당한 후에도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아 또 당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메르스, 수출 한국이 그렇다.
요즘은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경고가 도처에서 나온다. 특히 ‘일본형 장기침체’ 예측이 많다. 한데 이거 무시무시한 경고다. 다른 나라들은 오일쇼크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요인에서 장기 침체가 시작된 경우가 많은데, 일본형은 부동산 버블 붕괴, 정책 실패, 수출경쟁력 저하,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와 이로 인한 수요부진 등 내부 요인에서 시작됐다. 일본의 장기 침체는 20년이나 지속된 악랄한 경우였다.
일본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지칭되는 통화정책도 크지만 그 뒤엔 해외공장 유턴 전략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한 인프라 수출을 다각화하는 등 산업전략이 뒷받침됐다. 우린 기존의 수출 주도형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 골든타임은 놓쳤는지 모른다. 하나 ‘일본형 장기 침체’로 갈지도 모르는 골든타임마저 눈뜨고 놓쳐선 안 된다.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수요를 촉진하는 각종 구조조정 아이디어는 사실 도처에서 나온다. 방법을 아는 사람도 많다. 이제라도 당국이 귀를 크게 열고, 관성적 산업정책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발상의 산업 혁신안을 찾아야 한다. 우린 지속 성장해야 하므로.
양선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