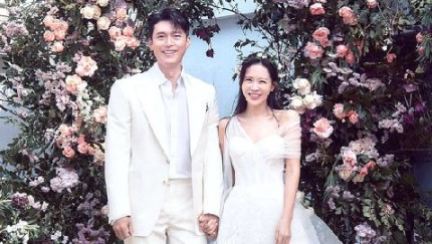세월호 선장과 선원, 그리고 해경의 미흡한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초기에 그들이 조금만 더 잘해 주었어도 대참사는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안타까움이 깔려 있는 비판이다. 릴레이 인터뷰 다섯 번째 순서로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나은영(52·사진) 교수의 분석을 들었다. 미국 예일대 사회심리학 박사인 그는 현대사회의 미디어 환경에도 관심이 많다. 나 교수는 “사회 지탱의 토대이자 민주시민의 기본인 안전의식 부재가 사고의 뿌리”라며 “유치원 교육부터 제대로 하자”고 제안했다.
-참사가 왜 발생했다고 보나.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이 철저히 무시된 결과다. 승객들이 배를 탈 때는 선박의 꼼꼼한 정비는 물론 적정량의 화물을 탑재하고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실상은 어땠나. 그 반대였다. 상식적인 믿음은 무참히 팽개쳐졌다. 가장 중요한 선장부터 대체 선장인 데다 그나마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선장과 선원은 물론 해경도 사건 초기 제 역할을 못한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가 닥치면 논리적으로 행동하기 힘들다. 그들이 승객들을 버린 것은 의도적인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다. 뇌가 몸에 시키는 대로, 자동반사적 반응에 의해 우선 살길을 찾은 거다. 그래서 필요한 게 평소 재난훈련이다.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이 먼저 나오도록 재난 시 대응요령이 몸에 배어야 한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때 그나마 희생자가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로 공격당한 월드트레이드센터 남쪽 빌딩의 안전요원이 첫 번째 빌딩 공격 이후 17분간 영웅적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킨 결과다. 전직 군인인 그는 1분 1초가 돈으로 환산될 정도로 몸값 비싼 빌딩 근무자들의 불평을 감수하며 안전훈련을 강력하게 주장해 관철시켰다.”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여승무원이 평소 재난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나.
“재난훈련에 의한 자동반응은 아니더라도 선장이나 여승무원 모두 각자 몸에 밴 대로 행동한 것이다. 개인차는 있게 마련이다. 선장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다면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평생 자기 이익만 챙기며 살아도 좋은 결과가 나와 그런 태도를 학습하게 됐다면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안타깝다.”
-한국적인 문화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문화적 특성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한국 사람들이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대개 빨리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게 사고가 나도 좋으니 빨리만 가져오라는 의미는 아니다. 안전배달은 당연히 바탕에 깔린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빨리 가져다 달라고만 한다. 이런 식의 의사소통을 학술적인 용어로는 ‘고맥락(high context)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이심전심, 암묵적으로 많은 메시지가 공유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대화다. 어쩌면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을 당연시하는 습관 때문에 막상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하다가 이런 큰 사고에까지 이어졌을 수도 있다.”
-사고 재발 방지책도 쏟아진다.
“묘수가 있겠나. 역시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서부터 기본에 충실하도록 교육하는 거다. 최근 미국 공영방송인 NPR에서 오클라호마주의 한 유치원을 소개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훈련을 시킨다는,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유치원은 어떤가. 사회화의 기초인 상대에 대한 배려를 배우기보다 초등학교 과정을 앞당겨서 선행학습만 시키려고 하지 않나. 성장 단계마다 빼먹어서는 안 될 기본이 있다. 그걸 충실히 가르쳐야 한다.”
신준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