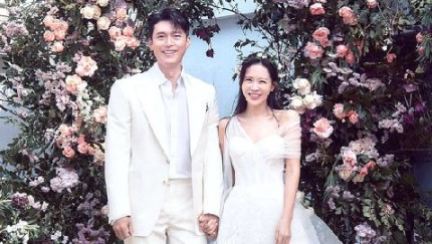나는 미군정 2년11개월간의 치적과 영향을 가끔 생각해 본다. 물론 군정이 시한적인 통치이고 여러가지 공과가 있지만, 이 기간동안 서울특별시헌장과 군정법령 제1백26호를 공포하였다는 사실은 전자가 미국식 개별헌장제도(Special Charter System)의 도입이고, 후자가 미국식 민주주의적 지방자치의원칙하에 국가발전을 촉진해 보려는 최상이었다는 점에서 의의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애석하게도 양자가 모두 실시면에서는 불발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기간동안에 경성부를 서울특별시로 승격시켜 경기도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한 미국식 분리(City-county separation), 영국식 특별시(county borough) 방법을 소리없이 이룩해논 성과를 크게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지방제도란 성장하는것이기에 만고불변의 유일한 것은 있을수 없고 그 성장의 기반인 국가사회의 환경에 따라 그 성장의 기반인 국가사회의 환경에 따라 달자질 수밖에 없다. 다만 궁극에 있는 지방주민의 복리증진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꾀해보자는 목표만은 다를바가 없으나 무엇이 그 길이나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뿐이다. 대구시의 직할시운동이 다시 재연된 모양이다. 지극히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된다. 이중 행정 이중감독의 폐단을 굳이들지 않더라도 1백20만 시민의 대도시적 행정수요를 일단은 눈 감을 수밖에 없게되어있는 농촌행정을 향한 도정의 지시통제에서 어떠한 낭비가 생기고 법적으로 동격이라 하여 5만내외의 다른 시와 동일한 방향으로 규정코자 하는 중앙의 휙일적지시에서 스스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없는 대구시의 입장은 이해하고도 남을수 있다. 위롭터의 통제기능이 약화되거나 시자체의 독자적 활동범위가 넓어지지 않는한 대도시행정의 특이성을 이해한다면 대구시의 직할시운동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럼프·카운티」(Rump County)의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서 한 대는 지정 도시운동에 그쳤던 일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이 경상북도 일원에 투자한 사회간접자본을 생각한다면 1963년 부산시가 경남으로부터 분리될 당시에 비교해서 경북의 위치는 훨씬 확고한 것으로 믿어진다. 도시화시대에 구각을 과감하게 탈피할수 없는 주위여건을 안타까와하고 있을 내무부로서도 차제에 이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행정의 경직성에 시간성을 배려하는 태도의 과시를 보여 주기 바라마지 않는다.
노강희(서울대 환경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