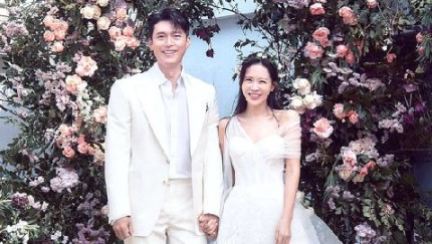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한국의 독일어시간」이란 제목으로 이곳의 권위지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지는 8월8일자 2면에 한국의 독일학 열을 크게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한국의 독문학 자들이 거의 망라되어 집필한 「독일단편문학대계」와 박부기 교수(고대)의「독문학사」등이 한국에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이다.
『동양과의 균형된 문학교류를 호소』라는 「서브타이틀」을 붙인 이 투고형식의 6단 기사는 『극동에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뜻밖에도 「괴테」에서 현대에 이르는 독일의 장편을 망라한 소설집이 나오고 4백여「페이지」를 넘는 독문학사가 나왔다. 독일인들은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고 스스로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3권으로 된 일지사 간행의 「독일 단편문학대계」는 「괴테」에서 시작하여「뷜」·「뒤렌맛」·「프리쉬」·「그라스」·「융거」·「렌츠」·「발서」·「바하만」·「힐데스하이머」등 현대독일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한국에 잘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대학생의 70%가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택하고 1천명에 이르는 독문학종사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움과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사는 아울러 독일학도들의 학구열에 비추어 그들의 회화실력은 높지 못하며 동·서양의 문화교류의 「밸런스」를 위해 한국인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독일체제 어학습득을 독일 측이 지원해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기사는 또 균형 있는 동서문화의 교류를 위해 한국인에 의한 한국관계 서적의 독일수입도 제의했다.
지난5년간 독일에서 20만 권의 번역물 중 일본·중국·「아랍」·「페르샤」·한국·인도 등의 언어로 번역된 것은 1.6%에 불과했고 서점에서 한국에 관한 책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학이 교수되고 있는 몇몇 대학의 한국학과에도 불과 4∼5명 정도의 한국인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드나들 뿐이며 이렇다할 학문적 연구를 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독일학자들이 독일을 소개하려는 노력은 이곳의 동양학자들이 한국을 알리려는 시도에 비해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동·서양 문화교류의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문화교류에 대한 독일인의 새로운 자세를 촉구했다.
그렇지 않아도 서양문화의 홍수를 겪고있는 동양에 더한층 불균형을 초래하는「짝사랑」으로서의 서양문화의 동양 흡취가 아니라 동양으로부터의 서양에의 도전이 곧 한국·독일학도들의 번역사업인 것이라고 매듭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