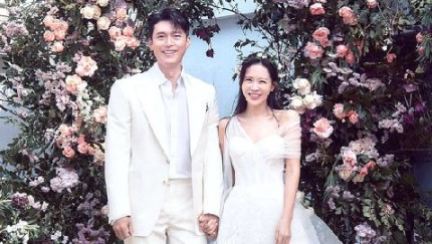2학기부터 전국 각 대학에서는 국민윤리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새로운 교양교육과정의 모형을 채택하게 됐다. 문교부가 지난 6월초에 성안한 모형교양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양학점을 35점에서 48학점으로 전체 1백60학점의 30%로 늘렸다. 이밖에도 영어와 제2외국어를 필수로 하던 것을 1개 외국어만을 필수로 하고 자연과학개론을 필수로, 인문사회학계는 생활한문을 필수로 하는 등의 새로운 내용이다. 이 모형은 국민윤리(4) 국어(6) 외국어(6) 철학개론(3) 문화사(3) 자연과학개론(3) 체육(4) 교련(6)등 모두 35학점을 필수로 과하고 나머지 학점을 인문·사회·자연의 각 계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있다.
대학원 교육이 강화되면서 전공과목의 연구는 그 많은 영역을 대학원에 넘겨주고 대학과정에서는 『지도자적 인격』의 양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다. 그러나 과연 한국에서도 전공학문을 대학원에서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교련과목에 6학점이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는가? 국민윤리는 수신교과서식의 구태를 재현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훈화식의 강의가 윤리문제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당국은 교육전문가의 의견과 교수·학생의 의견을 종합하는 기회를 더 갖고 각 대학에 학풍을 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 각 대학의 관계교수 및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한만운교수(고대교무처장)=모델이니까 강제성을 띤 것으로는 보지않는다.
국민윤리의 신설이 문제다. 고대에서는 철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학중에 세미나등을 가져 신중히 검토해보고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면 받아들이겠다.
▲이철주교수(연세대 교양학부장)=졸속의 인상을 주지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연세대의 경우는 2학기 시간표를 이미 짜놨다. 국민윤리의 경우 꼭 하라면 학점이 초과된다. 교양교육은 인문·사회·자연의 안배가 돼야한다. 지금 모델을 만든다면 인문에만 치중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번 모델은 또 교육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무시하고 있다. 외국어의 경우 외국에 나가공부한다면 연결도 안된다.
▲민석홍교수(서울대 교양학부장)=각 대학에 자유로이 교육과정을 짤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 문교부의 모델이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닌 줄 안다. 국민윤리는 교수와 교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시급히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교련은 작년부터 하고 있으나 모델을 만든다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학기말 시험이 끝나면 교양교육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용재익교수(숙대교무처장)=국민윤리에 말이 많은 것 갈다. 국가방침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교련이나 국민윤리가 정식과목으로 강의를 통해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실정으로 대학에서 교양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것은 아직도 사치에 가깝다. 담당교수는 물론 그 효과가 문제다.
▲박준희교수(이화대교육학)=교양교육 강화는 찬성이다. 그러나 너무 세분된 모형을 각 대학에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생길 수 있다. 반공교육을 위한 방향제시에 그치고 각 대학에 맡겨 전통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를 좀 더 해야 할 것이다.
▲배영훈군(성균관대철학과1)=제2 외국어를 선택으로 돌려 소홀히 하는 것은 대학생의 긍지에 손상이 되는 일이다. 더군다나 많은 시간을 교련과목에 뺏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제대로 효과있는 훈련도 못하면서 시간만 보내기 십상이다.
국민윤리는 철학적 범주에 속하는 윤리학으로 가치체계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라면 좋으나 어설픈 반공도덕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김동성군(연세대전자공학1)=교련때문에 대학생다운 시간을 갖지 못한다. 국민윤리는 다른 과목의 존경하는 교수를 통해 강의시간중에 인격의 접촉으로 보다나은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권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