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꾸는 꿈과, 보통 사람들의 미래 이미지는 차이가 크다. 첨단 과학자와 이런 기술의 미래를 낙관하는 일부 미래학자들의 미래 예측은 장밋빛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해한다. 마침 최근 러시아의 자칭 ‘화성소년’이 2013년이면 재앙으로 지구인의 대부분이 죽을 것이란 예언을 내놔 세계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디스토피아적 미래 이미지는 영화에 그대로 투영된다. 지구 멸망이 미래영화의 단골 소재인 이유다. 극적인 소재라야 영화의 흥행이 되는 탓도 있다.
영화 속 미래 이야기 미래 영화의 단골 소재 ‘지구 멸망’
지난해 개봉한 ‘2012’(사진)는 대표적 디스토피아 영화다. 이 영화엔 ‘마야 문명의 달력이 암시하는 인류의 멸망’이라는 운명론과 ‘지각운동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라는 과학적 예측, 여기에 ‘인류 멸망을 대비한 정부의 비밀 계획’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음모론이 비빔밥처럼 섞여 있다. 영화 마지막에는 급기야 전지구적 대홍수 속에서도 결국은 살아남는 21세기형 ’노아의 방주’ 모습까지 보여 준다. 성서의 소재를 끌어들여 할리우드식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굳이 해석하자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품화한 영화다.
우리나라 영화 ‘지구를 지켜라’(2003년·장준환 감독)는 미래영화라고 얘기하긴 애매하지만, 역시 끝은 지구의 종말이다. 모든 상업영화는 흥행을 노리지만, 이 영화는 흥행보다는 세상을 풍자한 SF코미디식의 실험영화에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흥행에는 실패했다. 지구인으로 변장한 안드로메다의 왕자(백윤식)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맞서는 한 남자(신하균)의 싸움이 영화 내내 이어진다. 결국 승리는 외계인의 것. 안드로메다의 왕자는 탐욕과 전쟁ㆍ살인ㆍ오염으로 얼룩진 지구를 살릴까 고민하다 결국 엄청난 광선을 쏴 지구를 폭파시켜버린다. 지난달 말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스카이라인(Skyline)’도 ‘지구를 지켜라’와 관점은 다르지만 역시 외계인이 지구를 공격해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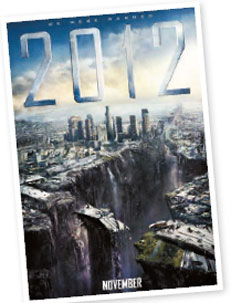
미래학자들에게 ‘2012’ 식의 지구 멸망이나, 외계인이 지구를 공격하는 ‘지구를 지켜라’ ‘스카이라인’과 같은 극단적인 미래 이미지는 연구 대상이 아니다. ‘미래는 인간이 꿈꾸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 미래 이미지는 당연히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스카이라인과 같은 외계인의 침공은 현대 물리학으로는 불가능한 상상이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물리학의 전제로 볼 때 지능을 가진 외계인이 지구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항성)이라고 해도 빛의 속도로 최소 4년은 걸리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에선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둘 다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대신 하와이대 짐 데이터 교수는 ‘이유토피아(eutopia)’라는 단어를 만들어 쓴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고, 우리의 노력에 운이 따른다면 달성할 수도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세상을 뜻하는 말이다. 그는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아니면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미래 청사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