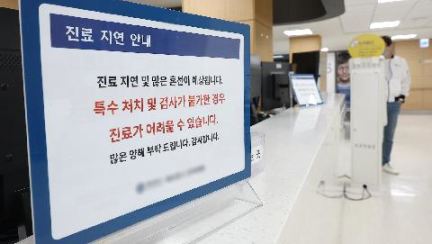정부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의 93개 단위지구 중 사업성이 없는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를 검토하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진통을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에 인천·부산·광양을 지정한 데 이어 2008년에 황해와 대구·새만금까지 확대됐다. 당초 의도대로 외국 기업이 들어왔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정치논리에 휩싸여 지역별 나눠먹기 식으로 추진됐으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올 상반기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는 6건, 27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3.7%에 불과하다. 선거 때마다 선심성(善心性)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 지역별 차별성조차 찾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외국 기업은 끌어들이지 못한 채 땅값만 치솟아 버렸다. 지금은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들어올 기업이 있을 리 만무하다. 상당수의 경제자유구역이 외자 유치를 포기한 채 아파트 장사로 개발 이익에만 치중하는 게 현실이다.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하루빨리 지정 해제를 하는 게 낫다. 아무런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형질 변경이나 건물의 신·개축 등 주민들의 재산권만 제약할 뿐이다. 물론 지정 해제로 정책의 일관성이 땅에 떨어지고 대외 신인도(信認度) 역시 추락할지 모른다. 지자체와 주민들도 “7년간이나 재산권을 묶어 놓다가 이제 와서 발을 뺀다”며 반발할 게 분명하다. 하지만 허울뿐인 경제자유구역을 계속 방치할 경우 갈수록 상처만 더 곪을 뿐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반발이 심하자 “강제로 해제하기보다 지자체와 협의해 원하는 곳만 해제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개발이 추진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사업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책임하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하고 사업성이 없는 졸속 사업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길은 제대로 된 구조조정밖에 없다.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d6e8bbf8-3a6a-47a3-8d3c-4bfc168b4c42.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