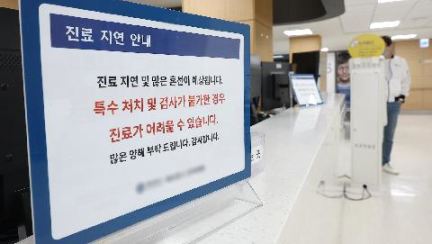음력 정월 대보름인 7일 새벽 3시 가야산 해인사. 반도의 남쪽이지만 깊은 산속 절집의 바람은 차다. 찬 바람을 가르는 북소리.
"둥, 둥, 두두둥, 둥둥둥둥…. "
점점 빨라지는 북소리는 눈 덮힌 겨울 계곡을 돌아오는 말발굽 소리처럼 깊고 우렁차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사물(四物 : 법고.대종.목어.운판 등 불교의식을 알리기 위해 두드려 소리를 내는 네가지 물건)중 법고가 가장 먼저 산을 깨운다.
이어 우렁우렁한 큰 종의 울림이 길게 여운을 남기며 퍼지는 사이 가사를 두른 스님들이 하나 둘 어둠 속에서 대적광전(大寂光殿.해인사의 큰 법당)으로 모여 들기 시작한다.
"사각 사각, 슥 슥 스으윽…. "
밤새 얼어붙은 잔설 위를 걷는 수도승들의 빠르고 가벼운 발걸음이 어둠을 가르는 소리가 뚜렷하다.
산짐승도 잠 든 시간, 깨어 움직이는 절집 사람들이 모두 묵언(默言.말하지 않음)하는 고요함 때문이다.
고요한 법당에 향내음이 가득찰 무렵 징소리가 웅웅거리며 예불이 시작된다.
"계향(戒香), 혜향(慧香), 정향(淨香)…" 으로 시작되는 저음의 예불문. 이어 "마하 반야바라 밀다심경…" 으로 시작되는 반야심경 독경이 점점 빨라지면서 법당 안은 불심에 숨이 막힐 듯하다.
이날은 동안거(冬安居) 해제일. 매년 음력 10월 16일부터 90일간 산중에 칩거하면서 용맹정진(勇猛精進.참선에 전념하는 일)하는 선불교 최대행사가 끝나는 날이다.
전국 사찰의 선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동안거지만 해인사는 남다르다.
선불교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허(鏡虛)스님 이후 해인사는 한국 선불교의 중심. 참선에 전념하는 스님들을 일컫는 '수좌(首座)' 들의 세계에서 해인사는 '안거 1번지' 인 셈이다.
안거 희망자는 많지만 해인사 본사의 선원에서 수용가능한 비구 스님은 40명에 불과하다.
인근 암자에서 따로 수행하는 비구니 스님은 80명 내외. 그래서 해인사 안거에 참여하는 스님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열아홉번째 안거를 마친 환기(幻機)스님은 "해인사는 정진하기 좋은 고향 같은 곳" 이라고 말한다.
고향을 떠나는 섭섭함은 있지만 명산대찰을 두루 찾아 정진하는 수도승이기에 마음은 벌써 태백산으로 향하고 있다.
태백산 줄기인 경북 봉화의 각화사에서 여름철 안거를 하기위해 미리 등록신청서를 내러 가야 한다. 신청서만 내고는 바로 오대산 상원사의 암자를 찾아 참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로운 구도의 길을 떠나기에 앞서 일종의 졸업식인 '해제법회' 에 참석해야 한다. 아침 나절 목탁과 발우, 그리고 낡은 가사.장삼 뿐인 여장을 챙겼다.
오전 9시 해제법회는 안거를 무사히 마쳤음을 부처님께 감사하고, 큰 스님의 당부말씀을 듣고, 안거증을 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철 공부한 힘으로 어느 놈이 진짜 도둑이고 어느 놈이 좀도둑인지를 가려내야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한철 밥만 축내고 좌복만 닳게 한 허물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인사 방장(方丈.최고지도자)인 법전(法傳)스님의 훈계가 준엄하다.
해방직후 기아선상에서 오로지 불심만으로 참선수행했던 봉암사 시절을 "정말 잘 살았던 시절" 로 기억하는 노스님. 그래서 수행 환경을 거의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해인사 선원에서 안거를 마친 수도승들의 안이함을 먼저 경계했다.
구내식당 곳곳에 붙어 있는 경구들은 이같은 방장 스님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놓은 명구다.
"이 공양(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치료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노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달랑 바랑 하나만 매고 선원을 떠나는 환기 스님. 안거를 마친 소감을 묻자 "매번 새롭지요" 라며 발길을 재촉한다.
다시 붙잡으며 '깨달음' 을 묻자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 이라며 묻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대신 수좌들 사이에 유명한 비유를 들려준다.
"한참 참선을 하다보면 코 앞에 당근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본다고들 하지요. 금방 깨물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혀를 내밀면 당근이 혓바닥에 밀려 멀어지기에 입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
그런 안타까움이 수좌들의 마음인가 보다. 선불교 전통에서 볼 때 깨달음이란 어느 순간 번득 찾아오는 것이다.
그 순간이 금방 올 수는 없지만 수행을 하다보면 깨달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조금씩 더해간다고 한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 울력(공동작업) 참 잘 했습니다."
스님은 아직 하얀 눈을 이고 있는 가야산 정상을 보며 한마디 내뱉고는 휙 발길을 돌렸다.
합천 해인사=오병상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d6e8bbf8-3a6a-47a3-8d3c-4bfc168b4c42.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