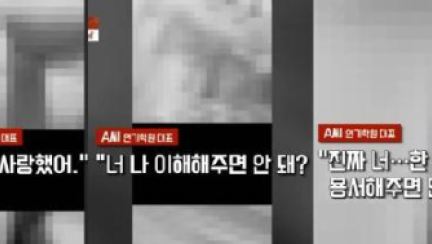제6장 두 행상
철규가 조창범의 하복부를 향하여 무지막지하게 몸을 내던지는 순간, 승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아 버렸다.
철규의 저돌적인 공격은, 그녀 스스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듯한 섬뜩한 절망감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선 어림조차 할 수 없는 찰나였지만, 절망의 최대치와 마주친 기분이었다.
그의 무절제한 공격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것이었다.
완력을 뽐내는 기량이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는 조창범에 비해도 서투르기 짝이 없었다.
어디서 그런 만용이 솟아올랐는지 알 수 없었다.
천만다행으로 조창범의 반격은 없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친 승희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조창범이가 반격의 자세를 취하려는 그 찰나에 그녀가 소리친 것이었다.
"조씨. 만날게요. 만나. " 그 한마디가 부러지고 말았을 철규의 갈비 몇 대를 온전하게 붙여 준 것이었다.
조창범의 불끈 쥔 두 주먹이 한철규의 면상을 향해 날아가려다 말고 멈추었다.
"우엘랍니껴 (어쩔랍니까) ? 참말로 만나 줄랍니껴?" " "만나 주겠다니까요. " 조창범은 믿기 어려운 듯 승희를 노려보며 강다짐을 두었다.
그리고 철규에게, 나이가 그만치 처먹었으면 하나 둘 셋 한 뒤에 행동하시오 하는 훈계를 남겼다.
그녀는 자못 의기양양한 조창범을 끌다시피 해서 근처의 다방으로 찾아갔 다.
옛날 이발소의 단골 그림이었던 밀레의 만종이 걸린 벽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아무려면 한철규보다 못할까 한 두서없는 자신감까지 생겼다.
어쨌든 이 우스꽝스럽고 끈질긴 미행에 종지부를 찍자면 늦었더라도 승희 몸소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았다.
끓어오르는 울화통을 참기 어려웠던 조창범은 가파른 숨결을 가다듬으면서 승희가 권하는 생수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켰다.
담배를 벅벅 피워대며 그가 털어놓은 자초지종을 듣고 난 승희는 어처구니없고 암담했다.
설득해서 내쳐야 할 장본인은 놀랍게도 조창범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 우스꽝스런 소동을 잠재우려면 그의 삼촌이 살고 있다는 영양까지 찾아가야 가능한 것이었다.
도대체 왜 이런 애꿎은 일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다.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비켜갈 수 없는 현실이란 것에 기가 막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응당 그의 삼촌 되는 인사가 승희가 있는 안동까지 찾아와 담판을 지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만나 보았자 필경 퇴짜를 놓아서 돌려보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동까지 나오라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자초할 빌미만 만들어 주는 꼴이었다.
도대체 어불성설인데도 승희가 영양까지 찾아가야만 아퀴가 지어질 문제였다.
기가 막히게 곤혹스러웠으나 영양까지 가겠다고 약속하고 말았다.
몇 번인가 다짐을 두는 조창범을 안심시켜 보낸 뒤 좌판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철규는 벌써 좌판과 화덕을 거두고 승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제가 소주 살게요. 그 자식 어디 갔어? 돌려보냈어요. 그냥 돌려보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랫배가 쑤시고 아프다길래 심상치 않아서 얼른 돌려보냈죠. 허우대가 그토록 우람한 자식이 아프다는 건 말도 안돼. 엄살이 아니고 정말 아픈가 봐요. 내가 너무 세게 박았나? 돌아서서 혼자 웃는데, 눈에 익은 용달차가 다가왔다.
철규와 같이 적재함에 짐을 옮겨 싣고 있는 태호의 표정이 사뭇 시무룩했다.
오늘 매상이 보잘것없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승희는 오늘따라 그런 태도가 그다지 안쓰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조창범에게 돌진하던 철규의 모습만 눈에 선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로 하여금 가슴 설레게 만들었던 철규의 그런 모습도 자주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승희로선 오래도록 기억해 두고 싶은 광경이었다.
(김주영 대하소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