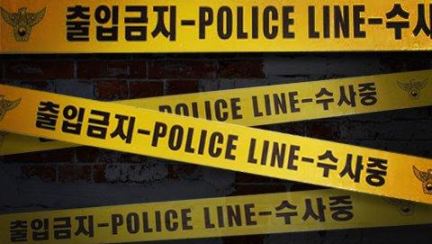한 달여 전 어느 일간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대학의 교양 과목 리스트를 구청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빗댔더니 말들이 많다. 대학은 직업 교육기관이 아니라 인성 교육을 하는 곳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리더를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필자가 주장하는 실용 중심의 교양 과목 개편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들이다.
필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연히 방문했던 동작구청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양 과목들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구청 문화센터에서도 배울 수 있는 수준의 교양 과목을 가르쳐서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였다.
많은 분이 대학생들의 인성을 기르기 위해 교양 과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도 일면 공감한다. 그렇다고 해도 학생들이 구청 문화센터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걸 배우려고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오진 않았을 게다. 부모들도 그러자고 한 학기에 500만원이나 되는 학비를 내주고 있겠는가.
체육학회에서는 필자에게 ‘대한체육회장이 어떻게 체육 과목을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체육 강사들의 자리를 빼앗느냐’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문학의 중요성을 높은 톤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예컨대 축구를 두고 말해보자. 축구가 대학 교양 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제축구연맹(FIFA)의 심판 룰이나 월드컵의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한 학기를 보냈다고 학점을 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심판 규정이 어떤지, 축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았을 때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수익이 창출되는지 등을 배우게 하자는 얘기다. 해외 고객들과 만나서 축구나 야구를 함께 할 기회는 없지만 미국 메이저 리그나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룰이나 현황, 사업구조와 같은 것들을 배워두면 대화를 이끌어 가는 데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런 것이 교양이 아니겠는가.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속하는 유명 대학에도 그 같은 교양 과목이 있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있다. 필자 역시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바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경쟁해야 할 미국 일류 대학의 학생들은 토플 시험을 보기 위해 영어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없다. 2년간의 국방의 의무도 없다.
그들이 한국어를 배워 한국말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 요즘 들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은 대학생이 영어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과 경쟁하려면 최소한 말은 통해야 한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체로 대학 1, 2년을 마치고 군대에 간다. 2년 동안 조직생활을 통해 끈기와 인내심, 협동심을 기르면서 학교 생활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런 의미에선 군 생활도 참 좋은 경험이다. 하지만 학업만 놓고 보면 얘기가 다르다. 2년 동안 공백이 있으니 외국 대학생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열심히 해도 모자라는 판에 뒤처지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양 과목에서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운동장에서 공 차게 하면서 학점을 주기보다는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실용 과목으로 개편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가 중앙대에 필수 과목으로 도입했으면 한다고 요청한 것 중 하나가 회계학 기초다.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회계와 연관돼 있다. 회계는 업무의 기본이다. 인문 계열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다수의 공대 계열 학생들은 회계학을 배우지 않고 취업한다. 기업에서 다시 비용을 들여 회계학을 배우게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회계학은 경영학과 학생 수준의 높은 단계를 일컫는 게 아니다. 최소한 차변과 대변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대학이 가르쳐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외국의 일류 대학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용 중심의 교양 교육이 중요한 건 그래서다.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칵테일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으로 충분하다.
이제 대학은 학생들이 국제 사회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경쟁력을 높여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대학생들이 외국 일류 대학 졸업생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중앙대 이사장
◆약력:서울대 경제학과·미 뉴욕대 경영대학원 졸업, 전 국제상공회의소(ICC) 회장,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현 두산중공업 회장
![[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