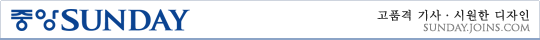주식시장이 뜨겁지만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이 뚜렷이 갈리고 있는 탓이다. 되는 쪽은 ‘중국’으로 통하는 펀드와 주식들이다. 중국·홍콩 펀드에 투자했거나, 국내 조선·철강 등 ‘중국 관련주’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지금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안 되는 쪽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정보기술(IT)주와 자동차주, 그리고 은행과 같은 내수주들이다. 지금 삼성전자·현대차·국민은행 같은 종목과 이들 종목을 많이 편입한 펀드들은 죽을 쑤고 있다.
이유야 뻔하다. 중국 경제가 워낙 잘나가는 반면, 미국과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답답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도가 있다. 주가가 기업의 실적을 너무 앞질러 가면 결국 탈이 나게 마련이다. 지금 중국 증시와 국내 중국 관련주는 분명 버블의 영역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중국 상하이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이 55배에 도달했다는 소식이다. 주당 1000원의 순익을 내는 기업의 주가가 5만5000원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개별 종목으론 PER이 100배를 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 세계 증시의 평균 PER은 17배 선이다. 같은 가치의 주식이 중국에선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중국 경제의 미래가 밝다고 해도 정상적이라고 인정하긴 힘들다.
문제는 증시가 항상 그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5년, 10년의 긴 사이클을 보면 분명 기업가치와 나란히 움직인다. 하지만 2∼3년 안의 짧은 기간을 끊어 놓으면 큰 거품이 생겼다 꺼졌던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이른바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 국면이다. 이럴 때는 일단 버블에 편승했던 사람들이 큰 수익을 올렸다. 다만 꼭짓점 이전에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대표적인 예가 1998년 10월에서 2000년 4월까지의 IT 버블이다. 당시 세계 각국 증시에선 기술주·닷컴주가 아니면 주식 취급도 받지 못했다. 미 나스닥에선 PER이 100배, 200배를 넘는 종목이 넘쳐났다. 굴뚝주들엔 그야말로 굴욕의 시간이었다. 지금 증시를 호령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포항제철의 당시 PER은 6∼7배에 불과했다.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현대중공업의 PER은 30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12배 수준이고, 은행주들의 경우 8∼9배에 머물고 있다. 길게 보면 지금의 소외주에도 분명 볕 들 날이 있을 것이다. 기다림의 문제일 따름이다.
하지만 당장은 버블에 편승해 보겠다는 투자자가 대다수다. 요즘 하루 3000억∼4000억원의 돈이 중국 펀드로 몰리고 있다. 중국 관련주를 사자는 주문도 끊이지 않는다. 버블의 끝은 누구도 모르기에 이들을 말릴 수는 없다. 다만 버블의 말로가 비참한 만큼 비중국 펀드나 주식에도 분산투자해 위험을 나누라고 조언할 수밖에.
김광기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김정숙 인도행 한달전 도종환 확정…전용기·타지마할도 없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d6f00dad-0184-4a30-9dae-d24b0f6929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탈북 외교관 "확성기 영향 대단…北, MZ군인 동요 두려워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768f11fd-b789-4f60-9f06-eccbafe8bca7.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