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중단됐다가 7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지난 주말 끝났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면회소 건설 공사를 곧 재개키로 한 것이나,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다음 달 초 열리는 적십자 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것은 성과다.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상반기 중 열차를 시험 운행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5월 초 재개키로 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식량 차관 제공 문제를 협의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다음 달 18일 개최키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6자회담의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은 다음 달 13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북한의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본 뒤 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의 진전과 대북 지원을 연계한다는 우리 측 협상 전략이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면 합의 논란으로 회담의 성과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장관급 회담의 남한 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북한에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지원하는 데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회담을 마치면서 배포한 공동 보도문에는 없던 내용이다. 공식 발표문에 없는 합의가 있었다고 장관 스스로 얘기하니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은 "합의한 게 아니라 북한이 요구한 수준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서둘러 해명했지만 이면 합의 논란이 우려되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정부의 대북 지원 강박증을 반영한 지나치게 성급한 처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그의 해명이 맞다 하더라도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하지 못한, 자질 문제를 따져 묻게 된다.
쌀이나 비료 같은 인도적 물자의 대북 지원은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필요한 물자가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지 정권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분배의 투명성이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원 과정의 투명성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뒷거래를 통한 합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 지원이 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이 같은 투명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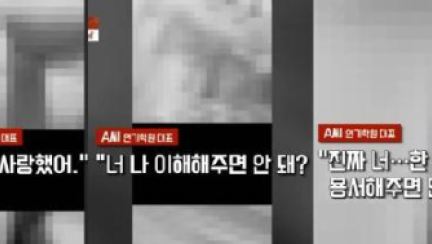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