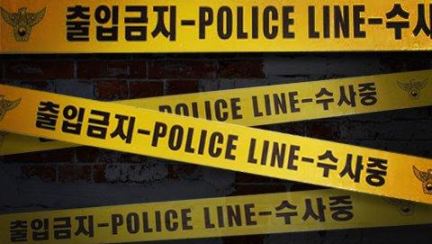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적 성장’을 들고 나왔다. 소득주도 성장의 산파였던 홍장표 경제수석을 경질하고 윤종원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앉히면서 변화는 이미 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용어를 내세웠다. 포용적 성장 담론이 그동안 심각한 부작용을 노출해 온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전환이라면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과감한 정책 전환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포장만 바꿨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OECD는 포용적 성장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번영의 배당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 성장’이라고 정의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설명한 2009년 세계은행 보고서도 직접적인 소득 재분배보다는 생산적 고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되 시장의 활력을 뺏는 직접적인 간섭은 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무모한 경제 실험이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급속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정책 의도와 반대로 고용 감소와 분배 악화, 소상공인 생존 위협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포용적 성장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이념에 치우친 정책 실험보다는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분배를 개선하되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경제의 활력을 꺾어 버리는 우를 경계해야 한다. 말로만 기업 기 살리기, 규제 완화를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장 정책이 나와야 한다. 포용적 성장이 단지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정권 지지층의 반발까지 돌파하는 용기와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

![[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