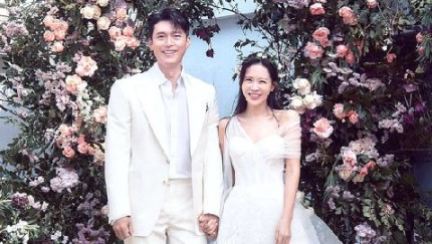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저는 시가 현실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탐미적인 예술성을 지니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읍니다]
여성으로서는 무척 단단해 보이는 고정희씨는 시인으로서의 자세도 무척 단단하다.
삶의 현장, 현실의 아픔이 고씨의 시 세계의 큰 주류를 이룬다. 그 아픔의 깊이에 들어가려는 성실성을 시인은 가져야한다고 주장한다.
『한시대의 시인으로 대우받는다면 응당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아픔과 고난·절망이 있으면 이것을 극복하고 꿈꿀만한 이상향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시인이라는 이름의 댓가를 다하는 것으로 본다.
시를 어떤 그릇에 담느냐도 고씨의 큰 관심이다.
『사상만 훌륭하면 시가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가 기법을 무시하면 큰 감동을 줄 수 없읍니다.』
사상만 두드려지게 드러내는 시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고씨의 시 기법은 2중의 포커스를 철저히 지키는데서 찾아지고 있다. 자체로서 완성되는 표면의 내부에 들어가면 상징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 그의 시의 특징이다.
『도요지』 『간척지』 등의 연작시들이 그러한 것이다. 『간척지』는 간척현장의 묘사속에 정신의 황무지를 드러내면서 정신의 부활을 그렸다.
75년 현대시학을 통해 데뷔한 고씨는 시집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시집이다.
요즘들어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표면한 시를 많이 쓰고있다. 『환인제』등에서 우리생활에 묻어나는 가락을 찾았다. 『베틀짜기』 『모심기노래』 『풀무질노래』등 노동도 다루었다. 고씨는 미래의 시는 우리고유 가락을 그 유산으로 가지면서 서구의 지성과 만나는 가락으로 상승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시인이 한문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고씨는 시인들이 보다 큰 아픔을 겪고 그 결과로 충격을 제시하는 시를 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