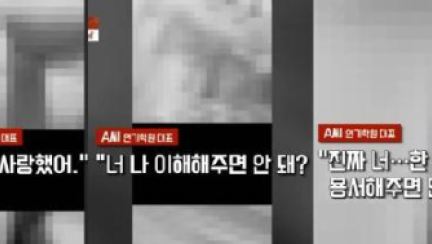공무원은 재직 기간 중 신분을 보장 받는다. 퇴임 후엔 연금도 보장돼 있다. 이는 충심을 다해 국민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고위공직과 공공기관 임원들이 퇴직 후 국가 돈으로 지원되는 대학 강의와 연구를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2008년부터 5년간 정부가 시행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601명 가운데 무려 546명(90.8%)이 1~2급 고위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원 출신 퇴직자였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국가 세금으로 예우를 받는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예를 들어 서남수 장관도 2008년 차관 퇴직 후 이 사업을 통해 2년 반 동안 9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장관 자리에 올랐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에서 활동하거나 사회 주요 분야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온 고위 전문 경력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전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 실적을 보면 취지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과학기술이나 민간 산업 경력자들은 극소수다. 대학들도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 위해 퇴직 공무원들을 희망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힐 정도라고 한다. 이러다가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대학 사회에 기부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로비 창구나 방패막이로 활용될까 우려된다.
우선 공직 출신자들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선정 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종업원 50명 이상의 기업 임원이면 지원이 가능했으나 현재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의 등기상 상근 임원으로 자격이 강화됐다. 요즘 기업이나 과학연구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대학 등 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재능 기부, 교육 기부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민간 분야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시대역행이다. 공직자들이 퇴임 후 사회에 기여하는 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제도가 퇴직 공직자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