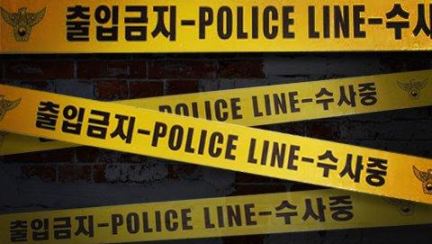위문희
위문희경제부문 기자
17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일본에서 여행온 주부 오노 아키코(大野亞希子·33)가 쇼핑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양말·청바지·티셔츠를 산 그는 “남대문시장에서 ‘깎아주세요’ ‘덤 주세요’라고 한국어로 말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졌다”며 “상인이 비싼 값을 부르면 나는 한참 낮은 가격을 요구한 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흥정하는 게 무척 재미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남대문시장에서 손님과 가게 주인이 흥정을 벌이는 모습이 한 달 반 뒤면 사라진다. 서울 중구청이 7월 1일부터 남대문시장에 대해 가격표시제, 그러니까 흔한 말로 ‘정찰제’를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남대문시장이 자초한 일이다. 몇몇 업소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운 게 문제가 됐다. 중구청은 “남대문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가격표시의무제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찰제 때문에 상인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남대문에서 15년 동안 의류점을 운영해온 정모(42)씨는 “깎아주고 덤을 주는 맛이 있어야 사람들이 올 텐데, 자칫 관광객뿐 아니라 국내 손님까지 잃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또 다른 상인은 “문제는 먹고 나서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포장마차에서 생긴 것인데, 모든 가게가 정찰제를 하라는 건 무리 아니냐”고 항변했다.
실제 남대문의 흥정 문화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흥행 요소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나온 한국 관광 가이드북에 “남대문에서는 ‘비싸요’ ‘깎아주세요’라고 하라”고 일종의 행동 지침(?)이 나와 있을 정도다. 상인들이 “일부 바가지가 있었다지만 남대문시장의 매력을 확 깎아내리는 정찰제를 굳이 강행해야만 했나”라고 항변하는 이유다. 상인들은 한편으론 “정찰제를 시행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면 운영의 묘를 살려 적절한 선에서 단속을 해줬으면 한다”고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참에 남대문시장이 ‘또 다른 매력’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의 몸부림 없이 50년, 100년 지속하는 사업은 어디에도 없다. 남대문시장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동아시아의 명소로 남게 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상인들의 고민이 절실하다.
위문희 경제부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