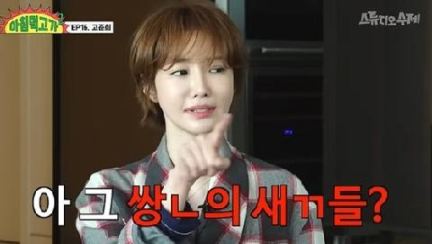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 20년 만에 대수술을 받는다. 그간에도 수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이번엔 기본 골격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큰 변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 시안에서 현재 중3이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이제껏 없었던 획기적인 수능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능 실시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두 가지 유형의 수준별 시험을 치르며, 탐구영역 응시 과목 수를 대폭 축소하는 게 골자(骨子)다. 수험생의 과도한 수능 부담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향은 맞다고 본다. 그러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려면 더 다듬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정부가 최종안 마련에 신중한 자세로 좀 더 심사숙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수능 연 2회 시행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질병이나 사고, 실수로 시험을 망친 수험생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두 시험 간 난이도(難易度) 조절과 공정한 점수 산정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1994학년도 첫 수능에서 두 차례 시험이 실시됐으나 다음해 바로 폐지된 것도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 자살 등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 탓이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는 수능 출제방식부터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기존의 한 달간 합숙 출제방식으로는 시간과 자료가 부족해 연 2회 수능을 감당하기 어렵다. 문제은행식 출제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해법이다. 교수·우수 교사·교육방송(EBS) 수능강사로 구성된 출제진이 수시로 문제를 만들어 시험문항 풀을 최대화한 뒤 시험 때마다 재가공해 출제함으로써 수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을 한 번 볼지, 두 번 모두 볼지를 수험생이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2회 모두 응시하게 하는 쪽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능 점수 산정을 새로운 ‘백분위 대비 변환표준점수’로 하더라도 1, 2차 시험 응시자 모집단이 달라지면 수험생 간 점수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영어·수학을 지금보다 쉬운 A형과 현행 수준인 B형으로 나눠 수험생이 골라 응시하게 한 건 기본적으로 옳다. 학교에서 교육은 수준별로 하고 시험은 동일한 수준으로 치러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자리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수준별 수능이 정착하려면 대학의 합리적인 수능 성적 반영 시스템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예컨대 B형 성적의 가중치 반영비율이 대학마다 들쭉날쭉하는 등 공정성이 흔들리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탐구영역 응시 과목 수를 현행 3~4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급격히 줄이는 것은 교실 수업 파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기본적인 방향만 13차례나 바뀌었고, 세부적으로는 사실상 해마다 바뀌어 온 게 우리 대입제도다. 이번 수능 개편은 혼란 없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마무리돼야 한다. 그래야 수시로 바뀌는 입시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학생·학부모가 그나마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