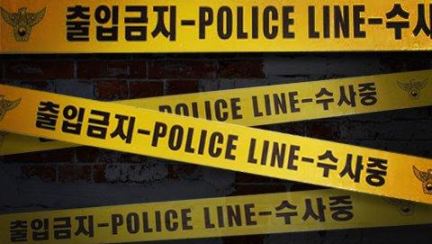국제화학올림피아드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받은 국내 일간지에는 중국이 연간 6백50억달러를 군비에 지출하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 됐다는 기사가 큼직하게 실려 있었다. 며칠 전의 올림피아드 시상식에서 중국이 금메달 네 개로 단독 1위를 차지하는 장면을 목도한 터라 그 기사는 더욱 심상치 않게 내게 다가왔다. 수년 전만 해도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57개국에서 나라 당 네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총 27개의 금메달이 주어졌는데 그 중 중국 대표단은 개인 순위 1,2,5,6등을 차지하며 최상위권을 휩쓸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둘·은메달 둘로 금 셋·은 하나를 받은 태국에 이어 대만·오스트리아와 동률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실험 교육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등학생으로 대학생도 해내기 어려운 이론과 실험·시험에서 그만한 성적을 낸 것은 크게 칭찬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발견에는 2등이 없다는 과학 분야에서 중국이 저렇게 약진을 거듭한다면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에 남아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중국의 비결은 무엇일까? 내 생각에는 대답은 금 둘·은 하나·동 하나로 폴란드와 동률 6위를 차지한 미국 코치의 말에 들어 있다. 미국만 해도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하는 네명의 대표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1차 예선에 전국에서 1만명 정도의 학생이 참가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처럼 치열한 경쟁에 나서겠다는 학생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쉽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려운 공부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설명이 부족하다. 미국도 유럽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 코치가 내게 들려준 바로는 미국엔 유럽에 비해 과학분야에서도 경쟁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쟁적 분위기가 튼튼한 과학기술의 토양에 작용해 미국의 힘이 나오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확실한 사회적 보상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선수들이 받은 물질적 보상일 수도 있고, 이공계 출신 중국의 리더들이 누리는 사회적 위치일 수도 있다. 중국이 저처럼 각종 당근으로 치열한 경쟁을 유발해 과학기술에서 약진하는데 우리는 이공계 기피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이공계 출신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또 다른 보상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대한 개인적인 만족이다. 최근 한민족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에 초빙된 기번스 전 미국 대통령 과학정책담당 보좌관은 "모든 젊은이들이 돈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자연의 신비를 깨닫고 우주적인 원리를 배우는 데 재미를 붙이면 돈은 뒷전이 된다.
우리는 월드컵에서 축구 강국들과 피나는 경쟁을 했다. 출전한 선수들도 선발되기까지 역시 피나는 경쟁을 했을 것이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개인 간에, 그리고 학교 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제가 좋아서 경쟁적으로 공부하는 나라가 되어 보자.
![[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