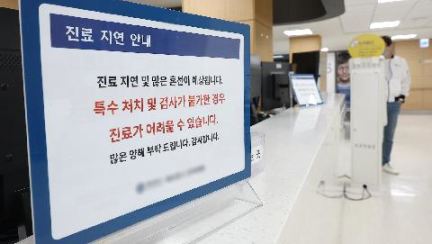정치인에게 ‘무엇’이 되기 위한 야망이 없다면 시체나 다름없다. 하지만 무엇이 되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왜 그것이 되려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다.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최근 행보도 그런 우려를 자아낸다. 2007년 대선 이후 그의 행보는 크게 달라졌다. 집권당의 지도자라고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우선 현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는 일이 많아졌다. 반대하지 않는 일에도 선뜻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청와대 만찬에 초청해도, 선거 지원을 요청해도 외면한다. 세종시 수정안 표결 때는 직접 반대토론까지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권을 강탈당했다는 ‘한(恨)’ 같은 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 현 정권이 실패로 끝난다면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일까.
그는 말도 극도로 아낀다. 그전이라고 말이 많은 건 아니었다. 그래도 결정적인 시점에 요점을 콕콕 찍어 내뱉은 말이 정국의 흐름을 좌우했다. 그런데 4대 강, 무상급식에도 입을 다문다. 한 박자 늦게 언급하는 방향도 묘하다. 촛불시위는 "이념이 아닌 먹을거리 문제”, 용산 참사는 "진압이 성급했다”며 현 정부를 겨냥했다. 천안함 피폭 사건이 나도 그는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진상 규명만 요구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아버지가 시해(弑害)당한 사실을 듣고도 “휴전선은요?”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들린다. 이러한 행보는 철저히 자신의 다음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그의 언행도 대선 이전보다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해 있다. 2007년 대선 때 대의원 투표에서 이기고도 여론조사에서 뒤집어진 이유가 이 대통령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된 때문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대북 발언은 지나치게 신중하고, 방송법도 여야 중간점을 선택했다. 지난달 21일 기획재정위에서는 소득 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며 성장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다. 현 정권과 차별화하고 왼쪽에 손을 내미는 ‘좌진(左進)’ 정책이다. 세종시 문제도 충청 표와 무관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 싸이월드나 트위터로 젊은 층에도 손짓하고 있다. 모두 박 전 대표의 고정 지지층과는 반대쪽을 겨냥한 것이다.
박 전 대표의 측근들은 “사사건건 나서면 오히려 국정 혼란을 야기한다”고 해명한다. 국정은 대통령이, 선거는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국정 운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친이(親李)계끼리만 해서도 안 된다. 집권당은 한나라당이다. 국정이 실패하면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 박 전 대표도 집권하면 계파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두나라당’이 된 책임은 이 대통령도, 박 전 대표도 피할 수 없다.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다시 올랐다고 한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22.7%에서 26.2%로 올랐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올 초까지만 해도 40%를 넘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해온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박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시에 송곳 같은 말을 던짐으로써 보수 진영의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 중요한 고비마다 침묵을 지키거나 이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간다.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보수 세력에게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불안감만 안겨주고 있다. 보수층이야 어차피 본선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일까.
박정희 시절에 대학을 다닌 필자로서는 유신독재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럼에도 장기집권은 했지만 조국 근대화에 대한 그의 집념 때문이었다고 믿고 싶다. 정치인에게는 헛소리겠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집권당 후보를 노리는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김진국 논설위원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