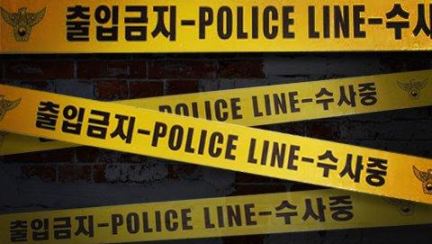참으로 먹먹했던 열흘이었다. 지난달 26일 천안함 침몰 이후 관심은 온통 46명 실종자의 생명에 가 있었다. 살아 있기만 간절히 바랐다. 특히 사건 다음 날인 27일과 28일에는 더욱 그랬다.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심정으로 내내 TV를 지켜봤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침몰된 함미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뿐이었다. 정보기술 강국, 경제 대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왜 이렇게 무력한지 이해되질 않았다. 길어야 사흘 정도 버틸 수 있다는데, 이러다가 모두 죽는 건 아닐까 안타까웠다. ‘젠장’ 소리가 절로 나왔다.
김영욱의 경제세상
기댈 곳은 대통령밖에 없었다. 이틀 내내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보이질 않았다. 안보전략회의를 여러 번 소집했다거나 ‘최선을 다하라’ ‘모든 장비를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뿐이었다. 대통령이 TV에 나와 대국민 담화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는 얘기도 있다. 일만 터지면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도 잘못됐다고도 한다. 이런 걸 감안해도 나서는 게 옳다고 본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 밖에 못한다고 해도 말이다.
위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기의 며칠간이다. 국민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게 최선책이라 생각한다.
이는 기업 위기관리의 오래된 교훈이기도 하다. 위기가 터지면 최고경영자(CEO)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최고위기책임자(CRO:Chief Risk Officer)에 맡겨놓고 뒷전에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위기 발생 땐 모두들 CEO의 말과 행동에 주목한다. 성공 여부는 사고 직후 하루 24시간 내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CEO밖에 없다.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CEO가 앞장선 기업은 대체로 성공했지만, 뒷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은 예외 없이 실패했다.
미국 존슨앤드존슨은 성공 사례다. 1982년 자사 제품인 타이레놀을 복용한 사람이 7명 사망하는 사고가 나자 버크 회장이 즉각 전면에 나섰다. 자신이 대변인까지 맡아 언론을 직접 상대했다. 정유업체 엑손의 로울 회장은 정반대였다. 89년 자사 유조선이 알래스카에서 좌초해 엄청난 원유를 유출했지만 그는 일절 현장을 찾지 않았다. 사건에 대한 언급도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잘못 대응할 경우 지지율이 급락하는 건 그래서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당시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던 이유다.
기업 위기관리의 두 번째 교훈은 정직이다. 은폐하거나 축소해선 안 된다, 변명하거나 책임 회피를 해서도 안 된다. 그래야 위기를 조기 수습할 수 있어서다. 반대로 하면?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위기관리는 실패한다. 엑손이 그러했다.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 유출 책임을 해안경비대와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 하지만 애시랜드정유는 180도 달랐다. 88년 유조탱크가 파열돼 오하이오 강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자 즉각 사건을 공개했다. 팀을 구성해 상수원 회복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멋진 사나이들’이라는 호평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와 군의 정보 공개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군사 비밀상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점은 이해된다. 그렇더라도 군이 왜 함미를 찾지 못했고, 어선이 찾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크게 미흡했다. 사고 발생 시각도 오락가락했다. 억측과 루머,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했던 이유다. 정확한 실상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원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을 게다. 당연히 피해는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이 본다.
참담한 사건이지만, 불행히도 이번이 끝이 아닐 게다. 사고는 늘 일어나고 또 다른 위기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렇다면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되새겨야 한다. 과거의 교훈을 오늘에 되살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