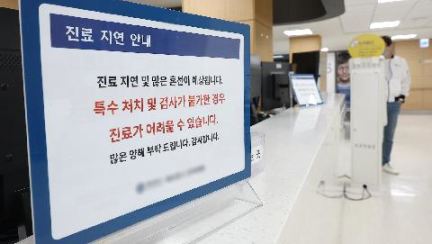아돌프 오크스가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1935년 4월 8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특별 애도성명을 냈다. 뉴욕시내 주요 건물들은 반기(半旗)를 달고 그의 고향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공장과 사무실은 하루 동안 문을 닫았다. 세계의 심장처럼 중단없이 뛰던 AP통신의 텔레타이프들도 2분간 박동을 멈췄다.
열네살 때 작은 지방신문의 청소부로 '신문업' 에 뛰어든 오크스는 세계를 통틀어 '좋은 신문' 의 대명사인 뉴욕 타임스를 후세에 선물하고 위대한 신문인의 생애를 마감했다.
왜 뜬금없이 남의 나라 신문의 사주 이야기인가. 그것은 오크스와 그의 뉴욕 타임스가 오늘 한국의 언론개혁 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3남3녀의 장남이었던 오크스의 형제자매와 조카들은 대거 뉴욕 타임스의 경영과 제작에 참여했다. 발행인 자리는 사위, 사위의 사위, 외손자, 외증손자로 계승됐다. 조카는 주필로, 사위의 사촌은 국제문제 대기자로 한 시대를 주름잡았다. 소유구조가 철저히 가족중심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족벌경영의 부작용을 겪지 않았다. 오크스의 언론관과 경영철학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편집간부들에게 보도와 논평의 철저한 객관성을 요구했다. 회사형편이 어려워 직원들이 퇴근한 사무실을 돌면서 전등불을 끌 만큼 긴축을 하면서도 뉴욕시가 제의한 거액의 광고를 거절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사와 소유구조상의 족벌경영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불공정하고 탐욕스러운 신문을 만든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주.발행인이 비전과 사명감을 가졌는가의 문제다. 한국의 신문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그것은 근대신문이 등장한 이후 1백년 동안 오크스 비슷한 발행인이 등장한 일이 없다는 사실 정도다.
뉴욕 타임스 같은 신문은 편집권이 독립돼 있다는 생각도 현실과 거리가 먼 신화다. 우선 사주는 신문제작의 총책임자인 편집국장 자리에 자신의 편집방침을 충실히 따를 사람을 임명하는 인사권의 행사로 벌써 편집에 개입하지 않는가.
그뿐 아니다. 1908년 뉴욕 타임스 특파원이 독일황제를 인터뷰해 독일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내왔다. 오크스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과 상의한 끝에 그 기사를 싣지 못하게 했다. 독일황제의 반(反)영국 발언이 미국여론을 흥분시킬 것을 걱정해서였다. 61년 케네디 행정부가 쿠바침공 준비를 할 때도 뉴욕 타임스는 특종기사를 축소보도했다. 발행인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서특필에 반대한 것이다.
결국 편집권의 완전독립은 이상론이다. 그것은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사주.발행인의 과잉개입으로 신문이 공정성을 잃고 파행으로 가면 독자들이 떠난다. 이것이 권력의 압력보다 무서운 시장원리다.
신문의 발행부수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있다. 빅3에 의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이 여론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뉴스 시청률의 거의 1백%를 차지하는 3대 방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의 영향력이 신문의 그것을 압도한다는 것은 방송인들의 자랑이다. 방송은 자신들은 슬쩍 빠지고 연일 신문때리기 프로로 편향된 언론개혁의 깃발을 들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야의 언론개혁 바람을 언론대책의 호재(好材)로 활용하고 있다.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가 문제다. 여론조사에서는 세무조사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만을 물을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언론개혁은 장기적인 과제다. 좋은 신문 만들자는 언론개혁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신문들은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각자 내부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결과는 곧 나타날 것이다. 한국판 오크스도 등장할 것이다. 정파와 집단이기주의를 떠나 이성적으로 언론개혁을 논의할 때다.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d6e8bbf8-3a6a-47a3-8d3c-4bfc168b4c42.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