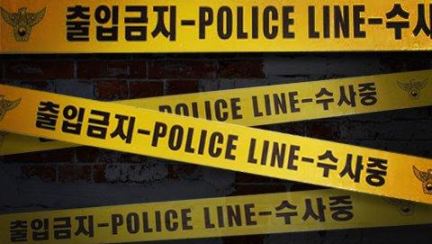한국 축구가 스페인으로부터 '한 수' 배우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나서 마지막회가 상영되는 영화를 보러 갔다.
'공동경비구역 JSA' .
본격적으로 올림픽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보러 갈 짬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길이 1백m도 채 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를 사이에 둔 남과 북의 네 초병들이 나누는 기막힌 우정을 유쾌하면서도 긴박하게 그려나가던 영화는 끝내 분단의 현실에 무릎을 꿇듯 두 병사의 비극적인 죽음을 던져놓은 채 쓸쓸히 끝을 맺는다.
자신을 형이라 불러주던 북한군 전사를 죽였다는 사실을 이겨내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남한 병사 이수혁의 죽음 앞에서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나 또한 저린 가슴을 가만히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는 손수건을 눈가에 댄 채 한참이나 있었고, 또 누군가는 자리를 뜨며 중얼거렸다.
"이게 현실인가. "
분단의 현실 앞에 좌절하는 젊음을 지켜본 지 만 하루가 지난 지금, 나는 전혀 새로운 현실 앞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어제 영화관에서 쓸어내렸던 가슴을 똑같이 쓸어내렸고, 그렇게 저미던 가슴도 여전했으며, 이미 9년 전 현정화와 이분희가 부둥켜 안았을 때 한번 목도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푸른 지도가 그려진 코리아의 깃발과 함께 남과 북의 선수들이 함께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으로 들어서는 장면은 분명히 새로운 현실일 수밖에 없었다.
"아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거지"
함께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몇 번이나 반복한 말이다. 기립 박수를 보내는 관중을 본 아이의 당연한 놀라움이었다.
사실 식전 공개행사로 펼쳐진 오세아니아의 장대한 드라마를 지켜보는 동안 나는 적잖이 주눅이 들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아흔여섯번째로 예정된 우리 선수단의 입장 순서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얼마 뒤에 만들어 낼' 가짜 감동 때문에 심히 괴로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주눅과 괴로움은 코리아의 흰 깃발이 화면 한 귀퉁이에 나타나는 순간 돌연히 벅참으로 바뀌어 버렸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호를 해주는 관중과 귀빈석으로 화면이 돌아가는 순간 그 벅참은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보아버렸다.
기수단 뒤를 따르던 남과 북의 선수들 틈에 끼어 있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를 사이에 둔 채 우정을 나누다 서로를 쏘아야만 했던 남북의 두 병사 정우진 전사와 이수혁 병장이었다. 그들이 새롭게 살아난 것이다.
현실은 때로 환상이다. 올림픽이 드라마인 까닭은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환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종 환상은 현실이 된다. 내가 본 공동경비구역의 두 병사의 죽음과 부활은, 환상이며 동시에 현실이다.
![[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