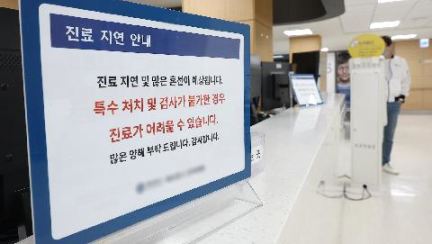김상현의 홈런은 좀 다른 데가 있다. 날아가는 타구의 회전이 유난히 역회전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공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쳐 공에 백스핀이 걸리고, 그 회전의 힘으로 공이 뻗어 나가는 게 도드라져 보인다. 그의 앞타석 ‘빅초이’ 최희섭이 1m96㎝, 109㎏의 ‘덩치’로 홈런을 때리는 인상을 준다면, 상대적으로 호리호리한 김상현(1m86㎝·80㎏)의 홈런은 “번쩍!” 하는 느낌이 들고 나면 빨랫줄 같은 타구가 날아가고 그 비행(飛行) 시간이 왠지 ‘아련~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 타구에는 마치 지난 10년 무명의 세월과 그 안에 서린 한(恨)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든다.
이태일의 Inside Pitch Plus <125>
김상현이 8월까지 31개의 홈런을 때려 내며 유력한 MVP 후보로 떠오른 것은 말 그대로 2009 프로야구의 신화(神話)다. 그가 4월 19일 LG에서 KIA로 트레이드되고 난 뒤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것도 드라마틱하지만, 그가 2002년 7월 31일 KIA에서 LG로 트레이드됐던 아픔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면 침이 꼴깍 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그가 빛나는 ‘해태 왕조’의 마지막 후손(그는 2000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했고 2001년 팀이 KIA로 바뀌었다)이며, 전통의 고교야구팀 군산상고의 1999년 황금사자기 우승 멤버고, 그 팀은 고교야구의 영원한 ‘역전의 명수’라는 것 등을 보태면 ‘아련~하게’ 날아가는 그의 홈런에 눈을 지그시 감게 된다.
2000년 2차지명 6라운드에 지명됐던 김상현의 잠재력은 현 KIA의 황병일 타격코치-조범현 감독이 아니었다면 활짝 피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다. KIA의 주포 라인이 이용규-김원섭-최희섭-장성호 등 왼손타자 위주여서 오른손타자가 꼭 필요한 배경도 있지만, 그게 꼭 김상현이었다는 건 100% 두 사람의 용인술(用人術)이다. LG시절 코치로 한솥밥을 먹기도 했던 황병일 코치는 김상현 타격의 장점을 누구보다 극대화해 냈고, 조범현 감독은 라인업 한가운데에 그의 이름을 적어 내고, 믿어줬다. 김상현의 전 소속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의 사부(師父) 황병일 코치와 조범현 감독은 누구보다 야구를 잘했던 고교 시절을 보냈지만 이후 후보 선수와 트레이드의 아픔을 겪었던 주인공들이다. 경북고 출신의 황병일 코치는 1983년 입단한 삼성의 주전 멤버가 되고 싶었지만 1986년 2월 단돈(?) 3000만원에 다른 3명과 함께 신생팀 빙그레로 갔다. 트레이드가 흔하지 않았던 그 시절, 타향의 신생팀에서 겪은 황 코치의 경험은 김상현이라는 진주를 흙 속에서도 알아보게 했다고 본다.
OB 베어스 창단 멤버 조범현 감독은 1990년 삼성으로 트레이드됐고 거기서 옷을 벗었다. 지도자로 꽃을 피운 건 1993년 쌍방울에서 박경완을 키워 내면서였고 이후 삼성-SK 등을 거쳐 지난해 KIA 사령탑이 됐다. 자신이 거쳐온 그늘이 김상현을 발탁한 믿음이 됐을 것이다.
세 사람이 만든 김상현 드라마의 교훈은 명쾌하다. 우리 스스로는 ‘나도 김상현’이라는 생각으로 신념과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고작 10년밖에 안 걸렸다). 그리고 혹 주변의 김상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눈을 자꾸 비벼 봐야 한다는 것. 제2, 제3의 김상현이 어디엔가 분명히 있고, 그들을 찾아내 신화를 쓸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d6e8bbf8-3a6a-47a3-8d3c-4bfc168b4c42.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