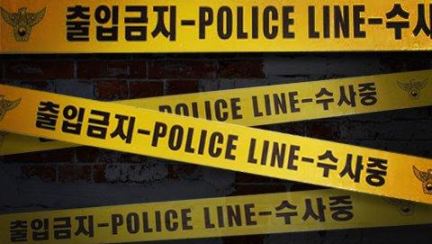IMF체제는 외환위기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한보.기아 등 대기업이 잇따라 쓰러지자 이들에 엄청난 돈이 물린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추락, 해외 자금조달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 은행의 외채 만기연장 비율은 26.3%로 곤두박질쳤다.
급기야 당장 갖다 쓸 수 있는 가용 (可用) 외환보유액은 거덜이 났고 결국 IMF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급박했던 외환위기는 지난 1월 국내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을 위한 뉴욕 외채협상이 타결되면서 수습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1월 협상타결에 따라 지난 4월 7일 총 2백17억달러의 단기외채가 1년 이상 장기외채로 만기가 연장돼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단기외채 만기연장의 여세를 몰아 뉴욕에서 40억달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데도 성공했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가 올들어 10월까지만 3백41억달러에 달해 총외채가 45억5천만달러나 줄어들어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반기에 들면서 외환사정은 더욱 호전됐다.
지난해 12월말 달러당 1천4백15원이 넘었던 환율이 1천3백원대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1천2백원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률도 6월에는 98.9%까지 올라갔다가 8월 러시아사태 이후 잠시 떨어지긴 했지만 현재도 8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도 여전히 '투자부적격' 이긴 하지만 그 단계는 높아졌다.
외환위기 당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의 신용등급이 B+에 장기전망은 '부정적' 이었으나 현재는 BB+에 장기전망도 '안정적' 으로 3단계나 뛰었다.
정경민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