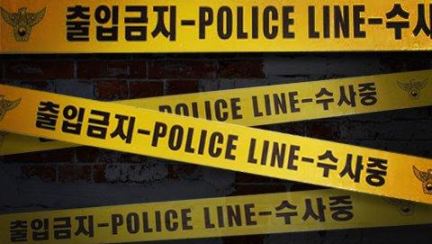미국과 영국의 생체공학자인 제임스 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인간염색체의'이중나선'이라 불리는 분자구조(DNA)를 처음 발견한 것은 1953년이었다.그레고어 멘델에 의해 최초로'유전법칙'이 밝혀진지 88년만의 일이었다.
이와 함께 시작된 분자생물학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진화와 본질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게 했고,인간의 생명관마저 바꾸게 했다.인간의 유전자가 모두 밝혀지는 경우 약 2천5백개에 달하는 모든 질병의 유전학적 진단과 예방,그리고 치
료의 가능성도 점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하면서 유전자검사에 따르는 윤리적.사회적 영향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유전과학자들은 사람의 유전자가 키를 크게 하고,건강하게,영리하게,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조작'할 수 있다는 증
거를'즐겨'밝혀내고 있지만 유전학이 통제가능한 정도를 넘어섰을 때의 사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점이 문제다.한 과학전문지는 슨을 다루면서'미친 과학자'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돼 온 것이 기업체의 고용문제와 보험문제였다.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주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작업조건이나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능력이나 약점을 미리 알아내려 할 것이며,보험회사들은 그 검사결과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요구할게 분명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우려에 대해 92년초 미국 보험협회 전문조사단이 대안(代案)으로 내놓은 것이 고작'유전자 검사의 사용과 그 보안유지를 위해서는 일관된 법적 근거와 일련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염색체란 바로 유전자를 담고 있는 그릇에 해당한다.각각 10만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염색체를 자유자재로 합성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된다면 보건임상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문제는 DNA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삶의 가치관과 생명의 존엄성을 몽땅 뒤엎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염색체의 합성에 성공했다는 소식은'인간 복제'의 가능성과 함께 과학의 발전이 어디에까지 이를 것인가 전율하게 한다.이젠'하늘의 섭리(攝理)'란 말조차 무색하게 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