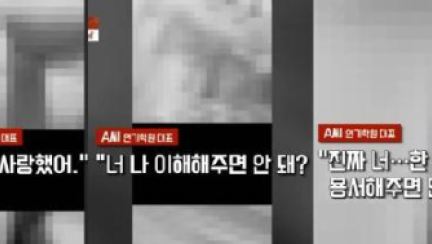로제 마르탱 뒤 가르 지음
정지영 옮김, 민음사
6권 총 2597쪽, 6권 전집 11만원
2000년 5권으로 출간된 『티보 가의 사람들』에 작가의 회고록 ‘회상’이 추가되면서 8년 만에 6권으로 완간됐다. 1937년 “인간의 투쟁을 날카롭게 묘사한 힘찬 사실주의”라는 평을 들으며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 작가 로제 마르탱 뒤 가르(1881~1958)의 역작이다. 유럽은 물론 일본에서도 이미 50년대 초반에 번역돼 베스트셀러가 됐던 작품이지만 국내에선 아직 생소하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번역에 20여 년을 매달린 정지영 명예교수(71·서울대 불문과·사진)의 결실이다. 한 친지가 “한국에 불문학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작품을 번역하지 않느냐”며 흘린 말이 계기가 됐다. 소위 ‘팔리는 얘기’가 아니면 좀체 번역되지 않는 출판시장에서 돋보이는 작품이다.
“즐거워서 했습니다. 소설은 재미있어야 해요. 저는 할수록 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꼭 이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죠.”
이야기는 자크라는 소년의 가출에서 시작한다. 소설 중반에 이르면 젊은이들이 청춘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들이 생생히 펼쳐진다. 그 밑으로 사랑·예술·반전·반자본주의 등 묵직한 주제가 흐른다. 그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작가의 솜씨가 놀랍다는 게 정 교수의 고백이다. “특히 감동받았던 부분은 아버지 티보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했어요. 참 감동적이었죠.”
원고지 2만 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분량이다. 양도 만만치 않았지만 ‘제대로 된 번역’에 대한 책임감이 더 벅찼다. “이 작가는 명사 하나에 형용사 2~3개를 쓰거든요.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로베르 사전 용례에 가장 많이 등장할 정도에요. 그러니 번역이 힘들 수 밖에요.” 그 절실함으로 98년에는 아예 직접 불한사전(두산동아)을 펴내기도 했다.
정 교수는 후배들에게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요즘은 번역을 너무 빨리 해버리죠. 그런데 번역은 한 번에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보고, 또다시 봐도 모자라요.” 이번에 추가한 144쪽의 ‘회상’을 번역하는 데만 2년간 공을 들였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시원섭섭하겠다는 말을 건네자 미소를 짓는다.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손보고 또 봐야죠.”
글=임주리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