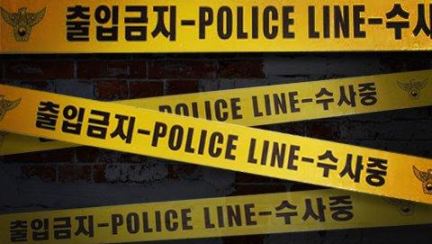“남미 펀드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한국에 옵니다. 투자 경력이 10년을 넘는 전문가죠. 브라질 등 남미 시장 투자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받은 전화다. 다른 운용사가 브라질 펀드 담당자를 초청해 여는 기자 간담회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일주일 전에는 또 다른 운용사에서 남미 펀드 매니저가 왔다며 인터뷰를 제안했었다.
상반기 국내 주식형 펀드 중 돈을 불려준 펀드가 단 한 개도 없고, 중국·인도 펀드는 원금의 3분의 1을 까먹었다. 그러나 브라질·남미 펀드는 10%를 웃도는 수익을 올렸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법하다. 그렇지만 인터뷰를 거절했다. 브라질 전문가가 지면에 너무 자주 등장해서다. 다른 언론의 기사까지 합쳐 보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브라질·남미 펀드매니저 인터뷰가 실린다.
1년 새 판이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브라질 펀드매니저는 그저 외신에서나 볼 수 있는 존재였다. 대신 중국 펀드매니저가 발에 차였다. 중국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었다. 시장에는 중국 전문가가 넘쳐났다.
중국 펀드가 시장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팔리는 펀드는 죄다 중국 펀드였다. 중국 펀드 하나쯤 없으면 펀드에 투자한다고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다. 고공행진하는 수익률이 무기였다면 현지 전문가들의 방한은 인기에 대한 지원사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중국 증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그 많던 중국 전문가의 발길은 뚝 끊겼다.
외환위기(IMF) 시절 1억원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번 ‘투자의 귀재’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사장은 펀드 직접 판매를 선언했다.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 시장은 잘 팔리고 쉽게 팔 수 있는 상품만 파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증권사나 은행을 중간에 낀 간접 판매 방식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고 펀드 직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다고 판매사만 탓할 건 아니다. 운용사도 결국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마케팅 계획을 짠다.
유행은 뒷북 투자를 부르고, 뒷북은 손실 가능성을 키운다. 투자자가 시장 유행에 휩쓸리도록 방치하거나 부추기는 것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금융회사의 도리가 아니다. 일관된 투자 철학대로 뚝심 있게 승부하는 운용사와, 회사의 단기 이익이 아니라 고객의 장기 수익을 고려하는 판매사가 보고 싶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