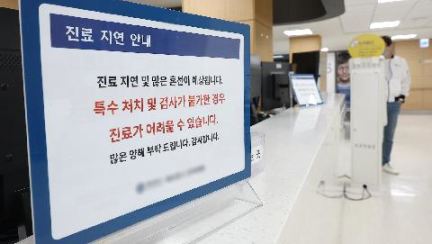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시인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취임 100일이 안 된 시점에서, 국정이 갈지자걸음을 하고 국민의 지지도가 20%대에 머물고 있는 원인을 정부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데서 찾았다. 일방통행 식 커뮤니케이션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하면 된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유로운 토론이나 대화가 자리 잡을 공간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실·국장들은 ‘못한다’는 말을 입에서 꺼내지 못했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하면 시장은 ‘건교부에 가서 애걸복걸해 법을 바꾸든지, 자리를 내놓든지 알아서 하라’고 호통쳤다”고 회상했다. 2002년 서울시장 취임 초기 이런 일이 한두 번 알려지면서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이 시청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청계천 복원 공사에서도 대통령의 리더십이 잘 드러난다. 청계천 복원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이 대통령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청계천 주변 22만 명의 상인, 1500명의 노점상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리고 “공무원이 나서서 4200회 이상 대화하고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냈다.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이 고생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청계천으로 나가 노점상과 4200회 대화하도록 한 것에서 ‘목표 달성’ ‘현장 중심’의 경영방침을 읽을 수 있다.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이 대통령은 공무원에게 불신을 갖고 있었다. 갑(甲)이 아닌 을(乙)의 입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이 그 바탕이다. 공무원이 관례에 따라 적당히, 눈치껏 일을 처리하려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서울시장 4년 동안 이 같은 구습(舊習)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시장 임기를 한 달여 앞둔 2006년 6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회고했다.
“시장 취임 첫날 월드컵기념관 건설 관련 결재서류가 올라왔는데 서울역사박물관과 동일한 단가로 계산돼 있었다. ‘역사박물관은 온도·습도를 다 맞춰야 하지만 월드컵 전시관은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더니 공사비가 일주일 만에 평당 1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 대통령은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다.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지고 돌려 말하지 않는다. 듣는 사람이 헷갈릴 염려가 별로 없다. 내용 없는 이야기를 체면 차리느라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는다. 쉬운 표현을 써 간결하게 말한다. 그리고 당장 결과를 요구한다. 언론과의 대담에서는 뜻밖의 ‘기사가 되는’ 말을 많이 해 대변인이 “그건 신문에 쓰면 절대 안 된다”며 수습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솔하게 비춰질 때가 많다.
이런 화법이 즉시 효과를 내기도 한다. 당선인 시절인 1월 전남 대불단지의 전봇대를 불필요한 규제의 표본으로 지적하자 금방 전봇대가 뽑혔다. 일산 성폭행 미수 사건 때 경찰서를 찾아가 질책하자 하루 만에 범인이 잡혔다.
하지만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말이 문제를 꼬이게 하는 경우도 많다. ‘하루 통행량이 220대에 불과한 톨게이트에 14명이나 근무하는 곳이 있더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해당 부처는 문제의 톨게이트를 찾아내느라 법석을 떨었다.
대통령의 말은 무게를 달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에게 대통령의 한마디는 법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때때로 공무원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가 하면 대통령을 앞세워 ‘오버’하기도 한다. 대통령의 언행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김광웅(행정학)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고 결정권자 리더십의 요체는 지식이 아니라 일종의 감각(센스)”이라며 “대통령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고 국민과 시대 흐름을 읽어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에게 CEO 리더십이 일부 필요하지만 CEO 리더십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기업의 운영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가 운영에서 갈등 조정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며 “앞으로 이 대통령은 본인이 성급히 나서기보다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을 관리하는 데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부호(경영학) 서강대 교수는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라도 지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실행 부서가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경직되게 처리하는 게 문제라고 노 교수는 진단했다. 그는 이어 “‘CEO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 대통령도 과거의 권위적인 CEO가 아닌, 개방적이고 아랫사람 얘기를 경청하는 CEO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우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d6e8bbf8-3a6a-47a3-8d3c-4bfc168b4c42.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