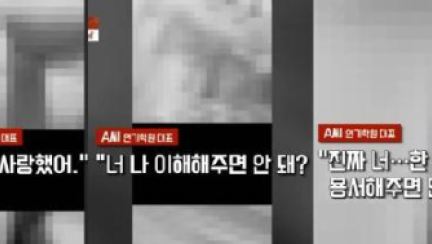「침체에 빠진 한국 프로복싱이 이동춘(李東春.32)의 목숨을앗아갔다.」 지난 5일 경기직후 쓰러져 수술을 받았지만 회생하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둔 李의 사인은 뇌출혈.그러나 선수를 이국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한국 복싱의 척박한 풍토가 원인(遠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두번이나 세계타이 틀에 도전했다 실패한 이동춘이 일본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것은 92년2월로 그의 나이 29세때.그는 안정된 생활과 세계정상에서겠다는 일념 하나로 복싱이 쇠퇴일로를 치닫는 한국을 떠났다.
당시 국내 복싱현황은 지금이나 다를바 없이 비참했다.선수들은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찰만큼 수입이 적었다.4라운드 선수가 40만원,10라운드 1백만원,국내챔피언 2백만원,동양챔피언이 되어야 4백만원 정도의 대전료를 받을 수 있었다.그 나마 대전료 가운데 매니저몫 33%,트레이너몫 10%등을 빼고 나면 선수들의 수입은 대전료의 절반 정도다.
이 때문에 80년대 5백명을 웃돌던 현역 선수가 90년대에 급감,현재는 3백명을 유지하기도 힘들다.프로복싱의 이같은 쇠락에는 방송국의 외면도 크게 작용했다.수입원중 80~90% 이상을 TV중계료에 의존하는 실정에서 TBC가 80년 방송통폐합으로 프로그램이 없어진뒤 KBS 『토요권투』와 MBC 『일요권투』가 잇따라 폐지돼 현재는 고정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다.간헐적인 세계타이틀전 중계로 간신히 명맥만 잇고 있다.
뜻있는 복싱관계자들은 프로복싱의 회생을 위해서는 방송국의 관심 이외에 라이벌전 유치등 복싱인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또다른 이동춘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지난 8월23일 광명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김재경-백종권 의 국내 중량급 라이벌전에는 6천여명의 관중이 몰렸었다.화끈하고 수준높은 경기가 있는 곳엔 어디든 관중이 몰린다는 것을 입증한 좋은 예였다. 〈金相于기자〉